[현대사회와 불교윤리 ]
‘공公’과 ‘사私’의 윤리 ②
페이지 정보
허남결 / 2025 년 3 월 [통권 제143호] / / 작성일25-03-08 23:18 / 조회210회 / 댓글0건본문
온갖 인연들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사바세상을 사는 우리가 이른바 ‘공公’과 ‘사私’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공공 부문에서라도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도덕적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은 그 사회공동체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이후 전개된 일련의 한심한 상황들은 ‘공’적 관념이 없는 가운데 ‘사’적 윤리가 작동할 경우, 나라 전체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고전 공리주의와 ‘공公’적 윤리전통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나의 사적 이익 못지않게 남의 이익도 배려하려는 공평무사한 ‘공’적 태도와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은 “모든 사람은 하나로 계산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하나 이상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주1)고 간명하게 표현했다.
이보다 덜 자극적이긴 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주장 또한 그에 못지않게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이해관계를 떠나 자애로운 관망자로서 엄격하게 공평한”(주2) 입장에서 다룰 것을 주문한다. 이른바 ‘공평한 관망자[impartial spectator’ 또는 ‘이상적 관찰자(ideal observer)]’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주3) 이는 자신의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편견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윤리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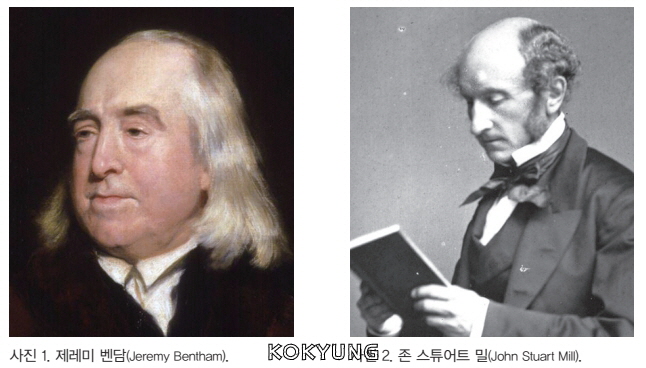
이러한 인식에 공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복이나 복지도 (행복의 양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작거나 클 수 없다.”(주4)는 명제를 함부로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상식적인 차원의 ‘객관성(objectivity)’과 ‘소박한 합리성(simple rationality)’에 호소하고 있다. 그 결과 공리주의는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호소력(simple but powerful point)’을 지니게 되었다.(주5) 이와 같은 ‘impartiality’의 요구는 일상적인 관성에 젖어 행동하기 마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성찰할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시도해 볼 만한 윤리적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판자들의 눈에는 공리주의가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행위 기준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존 롤즈(John Rawls)는 공리주의가 한 개인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decision-making procedure)’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회 전체(society as a whole)’로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것은 ‘인격체 간의 차이(the distinction between persons)’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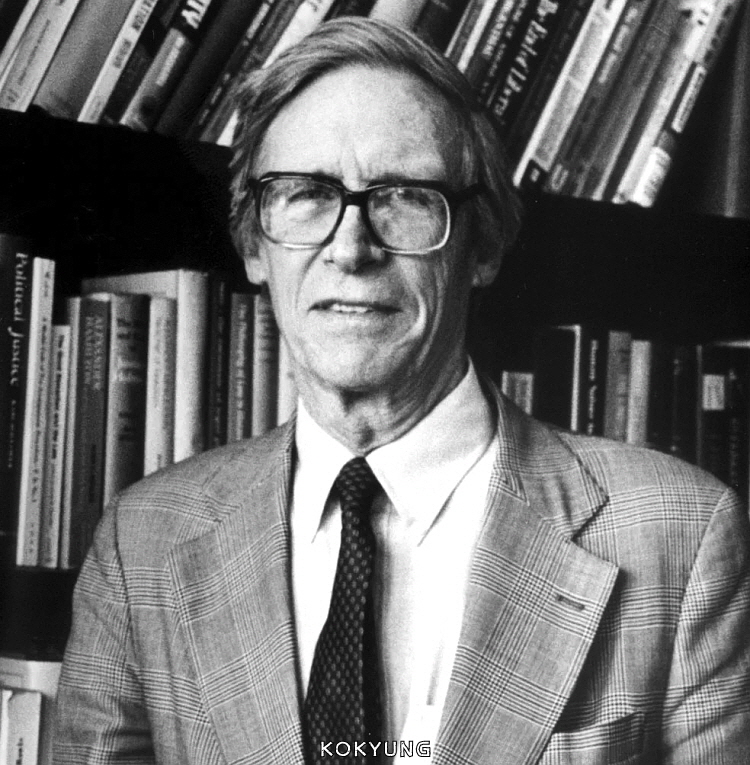
“사회적 협동체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한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한 결과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확대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공평하고 동정심을 가진 관망자의 상상적 행위를 통해 모든 사람을 하나로 융합한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는 개인들 간의 차이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주6) 이 말은 공리주의가 ‘사람들(people)’을 ‘서로 다른 개인들(distinct individuals)’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윤리적 개별자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으로 들린다.
묵가와 ‘공公’적 윤리전통
동양의 묵가사상도 서양의 공리주의 윤리설에 못지않게 ‘공’적 ‘impartiality’의 측면을 강조한다. 인간의 본성에는 가족주의와 같은 ‘사私’적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공公’적 사고도 함께 지닌다고 주장했다. 사회개혁가들은 인간 본성의 이런 측면을 부각하고 이를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의 묵자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유교윤리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 비롯되는 차등적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묵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 이롭게 하지[兼相愛交相利]”(주7) 않는 불평등한 관심에서 찾고 있다. 겸애란 나와 남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친함과 소원함을 떠나 한결같이 상대하는 차별 없는 사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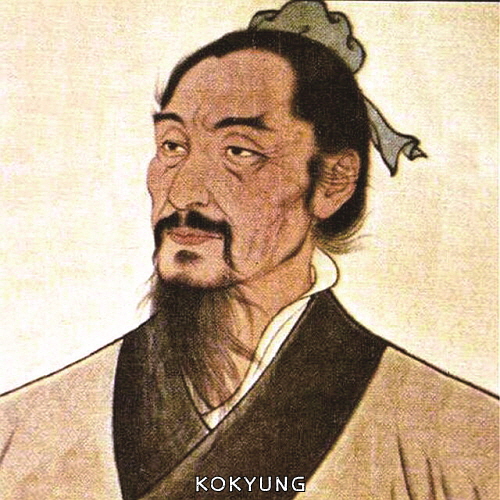
말하자면 그것은 ‘모든 것을 끌어안는 사랑(all-embracing love)’으로 가족과 친구 및 인간 일반을 똑같이 다루는 보편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묵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partiality’의 정서를 ‘impartiality’나 ‘universality’의 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주8), 그때에나 비로소 인류는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concern for everyone)’은 유가윤리에서 건강한 사회관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도덕 상식과는 어긋난다. 묵자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우리들의 ‘불평등한 관심(the unevenness of the concern)’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화와 억압 및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등적 관심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을 하나로 아우르며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실로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묵자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은 모든 사람에 대한 ‘공’적 관심인 ‘impartiality’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갖는 ‘사’적 태도인 ‘partiality’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초기 불교와 ‘공公’과 ‘사私’의 무분별적 윤리전통
유명한 『싱갈로와다 숫따(Siṅgālovāda Sutta)』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적 감정, 즉 ‘partiality’의 정서를 공유해야 할 세속적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들이 나와 있다. 예컨대, 가슴을 나누는 친구의 자격에 대해서 경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취해 있을 때 보호해 주고, 취한 자의 소지품을 보호해 주고,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 주고,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두 배로 필요한 물품을 보태어 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네 가지 경우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친구는 가슴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이런 감정은 잘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도 보여 주어야 할 보편적 동정심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특별한 감정임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 이런 친구 사이에는 서로 “비밀을 털어놓고, 비밀을 지켜주고,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목숨까지도 상대방을 위해 내놓는”(주9) 끈끈한 ‘partiality’의 유대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붓다는 재가 신자들과 달리 출가 수행자들에 대해서는 이와 상반된 인간관계를 주문했다. 특히 수행자들이 무리지어 생활하는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를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남기셨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비구가 무리지어 사는 것을 좋아하고 무리지어 사는 것을 즐기고 무리지어 사는 즐거움에 몰두하며, 무리를 좋아하고 무리를 즐기고 무리의 즐거움에 몰두하면서도 혼자서 한거閑居하는 것을 즐기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혼자서 한거하는 것을 즐기지 못하면서 마음의 표상을 취하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마음의 표상을 취하지 못하면서 바른 견해를 원만하게 갖추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바른 견해를 원만하게 갖추지 못하면서 바른 삼매를 원만하게 갖추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바른 삼매를 원만하게 갖추지 못하면서 족쇄들을 제거하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족쇄들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열반을 실현하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주10)
말 그대로 이 인용문은 붓다가 다른 사람들과 무리지어 생활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로 인해 수행이 지장 받을 것을 경계하고 있다. 붓다가 언급한 ‘무리’에는 동료 수행자들 및 그들과 직,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재가 신자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붓다의 판단은 비록 수행을 위한 것이긴 하나 개인들 간의 사사로운 교제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요약하면 붓다는 재가 신자와 출가 수행자에게 각각 다른 뉘앙스의 도덕관념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자에게는 세속적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적 관계를 중시하는 ‘partiality’를 허용한 반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후자에게는 출세간적 수행생활에 요청되는 ‘공’적 사고인 ‘impartiality’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미래지향적 ‘공’과 ‘사’의 윤리
공평무사한 이성적 사고를 추구하라는 도덕적 명령과 사적인 인간관계에 토대를 둔 관행적 윤리기준 사이를 지혜롭게 조화시키는 일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유가와 묵가는 상대방에 대해 너무 편협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불교윤리에서는 ‘impartiality’와 ‘partiality’의 도덕정서가 깨달음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다는, 인식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공’과 ‘사’의 불분명한 경계 및 ‘impartiality’와 ‘partiality’의 부조화 현상이 초래하는 도덕적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양쪽으로 갈라진 국론분열 현상도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정실주의와 연고주의 문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나마 ‘공’과 ‘사’를 구분하려는 윤리적 성찰의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우리 모두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겠다.
<각주>
(주1)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 J. M. Robson ed., Essays on Ethics, Religion and Society,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9),vol. x. p.257.
(주2) Ibid. p.218.
(주3) 물론 공리주의에서만 ‘impartiality’란 관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계약론자인 롤즈(John Rawls)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나 메타윤리학자인 헤어(R. M. Hare)의 ‘보편적 기술주의(universal prescriptivism)’란 개념 또한 이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도덕이론은 ‘impartiality’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주4) William H. Shaw, Contemporary Ethics; Taking Account of Utilitarianism(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1999), p.100.
(주5) Ibid. p.84.
(주6)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p.24~26 및 p.27 참조.
(주7) 『墨子』 兼愛中篇.
(주8) Fung Yu-lan, A Short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New York: Macmillan, 1960), p.90.
(주9) 각묵스님 옮김, 『디가 니까야(제3권)』(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6), pp.323〜324.
(주10) 대림스님 옮김, 『앙굿따라 니까야(제4권)』(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7), pp.275〜276.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비운의 제6대 달라이 라마를 아시나요?
정말로 잠양갸초의 고향집은 인도 동북부 끝자락의 따왕사원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자그마한 사원인 우르겔링 곰빠(Urgyeling G.)로 변해 있었다. 제6대 달라이 라마, 잠양갸초의 고…
김규현 /
-

불교의 법적 지위 획득에 노력한 함부르크불교협회
세계불교는 지금 26_ 독일 ❷ 글_ 툽텐 잠빠 번역_ 운산 함부르크불교협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모든 불교전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공통…
고경 필자 /
-

대흥사로 가는 길은 봄도 좋고 겨울도 좋다
거연심우소요 53_ 대흥사 ❶ 대흥사大興寺는 한반도 땅 남쪽 끝자락에 있는 두륜산頭輪山(=頭流山=大芚山)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이다.…
정종섭 /
-

당하즉시와 본래현성
중국선 이야기 48_ 운문종 ❸ 운문종은 후기 조사선 오가五家 가운데 네 번째로 출현하였으며, 오가는 모두 육조혜능을 계승했다고 표방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운문종의 선사상은 『육조단경』…
김진무 /
-

시비분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
질문 1. 시비[옳고 그름]를 나눔에 대해스님, 제가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를 가려야 되겠지요? 일을 당할 때마다 시是와 비非를 가리려…
일행스님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