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불교는 지금]
출가자와 사원 감소에 직면한 일본 불교
페이지 정보
고경 필자 / 2025 년 7 월 [통권 제147호] / / 작성일25-07-05 13:03 / 조회1,295회 / 댓글0건본문
사토 아쯔시_ 도요대학 강사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편의점 등에서는 셀프 계산대가 늘어나고 운전기사 부족으로 버스 편수가 줄어들기도 한다. 아이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각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에 따라 주지 없는 사찰 증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에 ‘소멸 가능성 지자체’라는 말이 화제가 됐다. 민간그룹인 ‘일본창생회의’의 분석에 따른 것으로 전국 1,800여 개 지자체 가운데 49.8%인 896개 지자체가 미래에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충격을 주었다. 지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은 인간이 사는 취락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는 사찰도 소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듬해인 2015년 이 문제를 거론한 우카이 히데노리가 『사원 소멸』이라는 책을 써 사원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을 설파해 불교계에 충격을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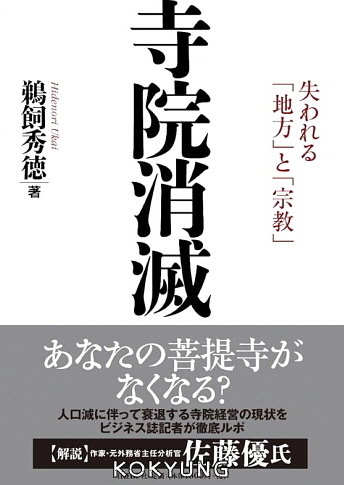
그런데 『사원소멸』이 간행된 지 10년 후, 일본의 사원의 감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불교 잡지 《월간 주지》 2024년 6월호가 현상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찰의 수 자체를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심한 감소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7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감소율은 1% 미만이어서 심한 감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찰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찰의 합병과 해산, 그리고 주지가 없는 무주 사찰이 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 전후부터 통폐합으로 인한 사찰 소멸이 증가하기 시작해 2020년을 기점으로 그 기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사찰 감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젊은 승려의 감소였다. 새로 승려가 되는 젊은이의 감소율이 일본 전체 인구의 감소율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
같은 《월간 주지》 7월호에서는 「인구 감소에 뒤지지 않는 사찰도 지역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지의 실천 특집」 기사에서 사찰로 사람을 불러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3건의 사찰을 소개하고 있다.
사원 감소를 극복하려는 사찰의 노력
첫째, 교토의 사찰에서는 사찰에 있는 벚꽃을 조명하는 것 외에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고 그곳에서 사찰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주지는 “참선이나 사경은 여러 사찰에서도 하지만 즐겁지는 않다. 자신은 불교를 즐거운 것으로 여기기 위해 맛있는 사찰음식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 시도는 명성을 얻었으며, 사찰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지역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둘째, 나가사키의 외딴 섬의 사찰에서는 바빠서 서로 교류하지 못하는 직장인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사찰이 부모와 자녀의 교실을 열고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후쿠오카의 임제종 사찰에서는 선농법禪農法으로 경작을 포기한 땅에서 주지가 손이 많이 가는 자연농법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지역에서 화제가 되어, 다른 곳에서 야채 재배법에 대한 도움을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불교 이외의 분야에서 지역 교류의 장을 만든다는 점이다. 언뜻 보면 사도邪道와 같은 느낌도 든다. 하지만 종래의 법도만을 고집하면 사람은 절에 오는 일이 없고, 절에 오지 않으면 불교를 접할 일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과 불교의 접점을 넓혀 가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늘어가는 무덤 정리와 무덤 친구 하카모토
저출산은 일본에서는 무덤 문제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은 그 사람의 집이 소속된 불교사원에서 치르고 그 사원에 있는 ‘가족의 무덤’에 묻혔다. 그리고 대대로 집안을 계승한 사람이 ‘가족의 무덤’을 지켜나가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해 집을 계승하지 않는 예가 증가해 왔다. 예를 들면,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 경우나, 자녀가 시골을 떠나 도시에서 살아서 묘지를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이다. 그래서 가족의 묘를 정리해 공동 공양묘로 이관하는 ‘무덤 정리’가 늘고 있다.

그리고 계승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승자가 없어도 되도록 영대공양永代供養(주1)을 의뢰하거나, 자녀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조상의 사찰에서 다른 곳의 사찰로 무덤을 옮기기도 한다. 다만 무덤을 옮길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 지방에서 도내 사찰로 옮길 경우 80만 엔에서 100만 엔, 수목장이나 영대공양으로는 30만 엔 정도가 든다고 한다.
이런 ‘무덤 정리’는 사원의 입장에서는 타격이 되고 있다. 사찰의 수입원 중 하나가 매년 법요와 묘지 관리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중에는 ‘무덤 정리’를 둘러싸고 사찰과 갈등을 빚고, 사찰이 따나려고 하는 집에 대해 패널티 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료離檀料’를 청구하는 예도 있다.
그런데 무덤 문제는 필자에게도 절실한 문제다. 왜냐하면 필자는 아내와 둘이 살고 아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무덤을 만든다고 해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둘이 살면서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남은 사람이 장례를 치르지만 남은 사람의 장례는 누가 치르나? 이렇게 혼자 죽어 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에 친족 등이 인수하지 않고 자치체가 화장이나 매장을 한 사체가 약 4만 2천 명에 달한다고 추계했다. 추계에 의하면 2050년에는 이 수가 448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필자 자신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특히 최근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일도 있어서 장례와 무덤 문제는 지금 우리 집안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NPO법인 엔딩센터’라는 단체다. 이 단체의 무덤은 수목장이다. 수목장은 일본에서도 드물지 않은데, 그 NPO의 특징은 사후에 같은 묘지에서 잠을 잘 예정인 사람들이 생전부터 교류하는 것이다. 같은 무덤에서 연결된 사람들을 ‘묘우墓友(하카모토)’라고 부르며 정기적으로 교류 행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하면 혼자서도 외롭지 않다. 이 법인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이노우에 하루요(井上治代)는 가족이나 무덤에 대해 연구해 온 사회학자이다. “가족의 연결고리가 희박해지는 가운데 혈연을 대신해 사후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필자도 만약 여기에 들어가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기는 것과 더불어 살아 있을 때부터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이 단체도 종교와 무관한 것은 아니고 법요를 행할 때에는 승려가 참여하고 있어 불교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종래에는 ‘사찰·묘·집(개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현대는 집이 존속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무덤을 운영하는 단체가 개인과 연결되어 거기에 사찰이 연관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묘지운영 단체·개인·사찰’이라는 관계이다.
인권과 선당의 경책警策 폐지
한국불교는 주류가 선불교이기 때문에 선불교와 관련된 화제를 하나 든다. 일반적으로 좌선당坐禪堂에서는 참선할 때 졸리거나 자세가 나쁜 것을 고치기 위해 경책警策을 쓴다. 그러나 일본 임제종 원각사파 대본산의 원각사에서는 경책을 폐지했다고 한다고 《월간 주지》 2024년 5월호가 다루었다.
하나조노대[花園大] 교수인 사사키 시즈카[佐々木閑] 교수가 원각사의 요코타 난레이[横田南嶺] 관장과의 대담에서 선당禪堂 안에서 경책을 써서 때리는 것은 좌선에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역사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부처님의 뜻과 어긋난다고 한다. 사사키 교수는 석가모니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들어줄 것을 엄하게 훈계하고 경책도 쓰지 않았다며 졸고 있는 승려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수행의 길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몽둥이로 두들겨 깨우는 것은 폭력의 긍정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간 주지》와의 인터뷰에 응한 조동종曹洞宗 스님은, 예전에는 경책을 포함해 승당 내에서 지나친 지도가 있었다. 하지만 경책까지 포함해서 재검토할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불교의 본래 가르침과 인권의 문제라는 두 요소에 의해 전통도 바뀌고 있다.
2024년 일본에서 화제가 된 불교 책
1) 우카이 히데노리의 『불교의 미래 연표』
이 책은 2027년부터 2079년까지 발생할 불교계의 다양한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중 예언된 것을 몇 가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027년 : 고령자 시설에서 온라인 참배가 당연해진다. 고령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성묘에는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런 이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일반화되는 것이다. 성묘에 대해서는 지금도 ‘성묘 대행 서비스’가 있고, 지방에 있어서 성묘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리로 묘소 청소부터 참배까지 하는 서비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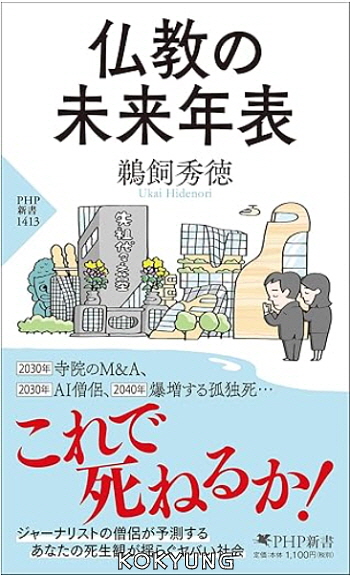
2028년 : 안드로이드 부처가 각지에서 설법을 개시한다. 이것은 로봇 부처님이 설법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토[京都]에 있는 고다이지[高臺寺]에 2019년 로봇 부처님이 등장했다. 저자(우카이)는 조형과 AI 기술의 진보로 이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미묘하지만, 일본 불교는 우상 숭배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2029년 : 수목장이 무덤의 주류가 된다. 나무 밑에 유골을 묻었다가 잠시 후 자연으로 돌아가는 수목장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에도 일본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일반화된다고 내다보았다. 조사에 의하면 장래 바람직한 묘로써 수목장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종래의 일본의 무덤은 가족묘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과 같은 무덤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살아 있을 때의 인간관계가 저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수목장은 개인묘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2050년 : 무슬림용 묘지가 늘어난다. 일본 내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외국에서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들의 장례 문제이다. 특히 이슬람교도의 경우 화장이 아닌 토장을 하기 때문에 토장용 묘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오이타현에서 무슬림을 위한 토장묘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빚는 일이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토장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가 불안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현대의 일본 사회는 전환기에 있고, 그에 따라 불교도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
2) 신메이의 『자기란 없으니까-교양으로서의 동양철학』
이 책은 현재 일본 불교서로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으며 1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한다. 저자의 경력은 도쿄대[東京大]를 졸업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큰 회사에 취직하지만 일을 못 하고 퇴사했다. 그 후 섬에서 재기를 도모하지만 실패한다. 개그맨을 목표로 하지만 좌절한다. 그리고 몇 년간 이불 속에 들어가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면서 동양사상의 책을 읽고 그 감상을 블로그에 발표해 주목받아 책이 된 것이다.
내용은 석가, 용수, 노자, 선, 신란[親鸞], 공해空海 등 6명의 동양 사상가가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보통의 동양사상 책과는 달리, 어쨌든 재미있다. 이 책이 가진 재미는 세 가지다. 첫째, 이야깃거리이다. ‘개그맨’을 지향한 만큼 글이 읽기 쉬울 뿐 아니라 매우 재미있다. 제가 지하철 안에서 읽으며 웃음을 참기 힘들었을 정도다. 둘째, 동양사상을 자기 안에서 잘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사상 서적의 경우 난해한 문장을 난해한 채 쓰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는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소화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훌륭하다. 거기에도 개그 센스가 있다. 셋째, 이것은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동양사상에 의해 저자 자신이 구원받은 체험을 쓰고 있다.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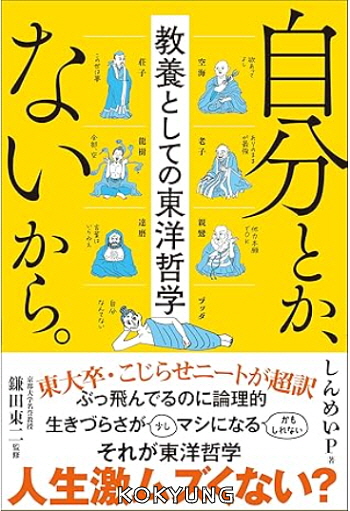
뭘 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제 끝이다. ‘비어 있음’을 감추기 위한 이야기의 거품은 모두 꺼지고 말았다. 섬으로의 이주, 연예인 도전. 표면 경력만큼은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 이불에서 잠을 잤을 뿐이다. 속은 텅 비어 있다. 성실하게 노력하던 친구는 30대가 되어서 출세하기 시작했다. … 나와는 달리 모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눈에 띄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도 제 몫을 해내고 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만 생각하며 살아왔다. 무섭게 ‘텅 빈’이다. … 학생시절 읽었던 동양철학 책. ‘텅 빈’이 된 지금, 마음에 박히게 되어 있었다. 공空의 철학. ‘나’는 애초에 ‘텅 빈’이다. 그리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최고다.
이처럼 이 책은 해설서가 아니라 동양철학에 의해 구원받은 한 인간의 기록이다. 이 저자는 시궁창에 빠졌을 때 스스로 동양철학에서 구원을 구했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 단지 이것은 도쿄대(한국이라면 서울대)에 갔을 정도의 지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런 사람도 힘들어한다. 그런 사람을 위해 동양철학, 불교가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가 과제다.
<각주>
(주1) 편집자 주 : 자손이 없거나 후손에게 묘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경우, 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조상의 묘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찰이 망자의 유골을 영구적으로 관리하고 공양해 주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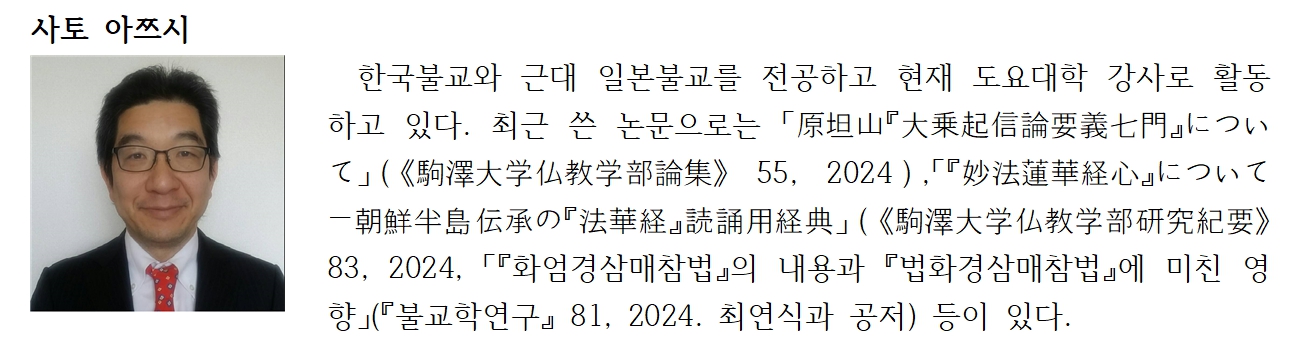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네팔 유일의 자따까 성지 나모붓다 사리탑
카트만두에서 남동쪽으로 52km 떨어진 바그마띠(Bagmati)주의 까브레빠란 삼거리(Kavrepalan-Chowk)에 위치한 ‘나모붓다탑(Namo Buddha Stupa)’은 붓다의 진신사리를 모…
김규현 /
-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
올 초 백련불교문화재단과 BTN 불교TV는 성철 종정예하께서 “부처님께 밥값했다.”라고 하시며 흔연히 펴내신 『선문정로』의 저본이 되는 큰스님의 육성 녹음을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원택스님 /
-

잊혀진 불국토의 섬 몰디브
많은 한국인이 몰디브로 여행을 떠난다. 코발트 빛 해안으로 신혼부부들을 이끈다.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26개의 환초로 이루어지는데 섬의 총수가 무려 2,000여 개(1,192개)에 달한다고 한다. …
주강현 /
-

운문종의 법계와 설숭의 유불융합
중국선 이야기 53_ 운문종 ❽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던 당조唐朝가 멸망하고, 중국은 북방의 오대五代와 남방의 십국十國으로 분열되었다. 이 시기에 북방의…
김진무 /
-

초의선사의 다법과 육우의 병차 만들기
거연심우소요 58_ 대흥사 ❻ 초의선사의 다법을 보면, 찻잎을 따서 뜨거운 솥에 덖어서 밀실에서 건조시킨 다음, 이를 잣나무로 만든 틀에 넣어 일정한 형태로 찍어내고 대나무 껍질…
정종섭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