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다 원효 혜능 성철에게 묻고 듣다 ]
불립문자와 언하대오의 발원지 붓다
페이지 정보
박태원 / 2025 년 4 월 [통권 제144호] / / 작성일25-04-04 10:24 / 조회14회 / 댓글0건본문
“도반들이여, 마치 목재와 덩굴과 진흙과 짚으로 허공을 덮어서 ‘집’이란 명칭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뼈와 신경과 살과 피부로 허공을 덮어서 ‘몸[色]’이라는 명칭이 생깁니다.”(주1) - 『맛지마 니까야』
‘몸’이라는 명칭은 동일 자아를 가리키지 않는다
중생 인간은 언어 호칭에 해당하는 ‘불변의 동일한 것’이 있다고 여긴다. 언어와 쉽게 결합하는 동일성 관념 때문이다. ‘갑순이’라는 호칭에는 갑순이만의 순수 정신이나 인격, 개성 등이 변치 않는 내용으로 간직되어 있을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갑순이’라는 호칭 안에는 동일한 내용, 변하지 않는 내용, 독자적인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다. 확인되는 것이라고는 오직 ‘다수·변화·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인과관계의 잠정적 응집 양상’이다. 일정 기간 유지되는 인과관계의 응집적 특징/차이를 ‘개인’ ‘인격’ ‘정체성’ ‘개체’ 등으로 호칭하면서 다른 특징/차이와 구분할 뿐이다. 언어 명칭이 불변 자아를 지시한다는 생각은 ‘언어에서 비롯된 동일성 관념이 빚어낸 존재 환각’이다. 선종의 불립문자 천명은 이런 통찰을 발원지로 삼고 있다.
이름이 동일 자아를 가리킨다고 여기는 중생 인간은, 죽은 후 그 동일 자아가 사후 세계에서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라고도 믿는다. 사후에는 정신과 신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원한 행복이나 고통을 받을 것이라 믿기도 한다. 동일한 정신·신체가 미래의 삶에 재현되어 행복한 영생을 누리거나 영원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대다수 종교를 존속시키는 현실적 원동력이다.
동일 자아의 사후 영생을 꿈꾸는 사람에게, <정신과 신체의 어떤 상태가 영생의 주체이길 기대하는가? 10대의 신체, 20대의 정신, 아니면 죽기 전 노쇠하고 병든 정신과 신체?>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할까? ‘가장 완전하고 건강한 상태의 심신’이라 답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당신의 삶에서 경험한 ‘가장 완전한 정신과 신체 상태’는 어떤 내용인가? 끊임없이 변하는 정신과 신체 상태 가운데 어느 것을 콕 짚어 ‘사후에 재현할 동일 자아’이길 기대하는가? 과연 그런 선택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까? <절대 권능을 지닌 자가 알아서 대행해 준다>라고 대답할까? ‘불립문자’는 이름을 동일 자아로 여겨 사후 영생을 그려보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장군죽비將軍竹篦이기도 하다.
명칭은 잠정적 용법이고 인습적 표현일 뿐이다
“찟따여, 예를 들면 소로부터 우유가 있고, 우유로부터 응유(응고된 우유, curd)가 되고, 응유로부터 생 버터가 되고, 생 버터로부터 정제된 버터(ghee)가 되고, 정제된 버터로부터 최상의 버터(제호醍醐)가 되는 것과 같다. 우유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응유라는 이름을 결코 얻지 못한다. 생 버터라는 이름도 결코 얻지 못한다. 정제된 버터라는 이름도 결코 얻지 못한다. 최상의 버터라는 이름도 결코 얻지 못한다. 그때에는 오직 우유라는 이름만 얻을 뿐이다. …
찟따여, 그와 마찬가지로 ‘거친 자아의 획득’이 있을 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을 결코 얻을 수가 없고 ‘물질이 아닌[無色]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도 결코 얻을 수가 없으며 그때에는 오직 ‘거친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만을 얻게 된다. 찟따여,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 있을 때에는 ‘거친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은 결코 얻을 수가 없고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도 결코 얻을 수가 없으며 그때에는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만을 얻게 된다. …
찟따여, 이런 [자아의 획득]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표현이며, 세상의 언어이며, 세상의 인습적 표현이며, 세상의 개념이다. 여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집착하지 않고 표현할 뿐이다.” (주2) - 『디가 니까야』

이름은 ‘다수의 심신 현상이 상호 조건적 인과관계 속에서 일정한 응집성을 한시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사태’를 지시하는 기호記號이다. 그리고 이 기호는 응집성·정체성을 형성하는 조건들에 따라 바뀐다. 그 형성 조건들이 응집성·정체성을 바꿀 정도로 변하면 명칭도 변한다. 응집성·정체성을 형성하는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명칭도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조건은 예외 없이 역동적인 변화와 관계의 현상이다. 그래서 명칭은 한시적·잠정적으로만 유효하다.
명칭에는 ‘불변하는 동일 자아’가 없다. 명칭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면서 일정 기간 유지되는 응집성·정체성에 대한 잠정적 호칭’일 뿐이다. 그러나 그 잠정적 호칭은 언어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필수적이다. 개체를 지칭하는 호칭은 ‘차이들의 구분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언어의 지시 내용을 불변의 동일성으로 채우지 말라. 불변의 동일성은 ‘사실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어를 배제하지도 말라. 동일성 관념의 옷을 입히지 말고, 단지 ‘차이들의 구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만 사용해라. 언어가 없으면 ‘사실 그대로’를 성찰할 수도 없고,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이로움’을 구현할 수도 없다. 언어를 ‘재앙의 문’이 아니라 ‘만복의 문’으로 바꾸라. 동일성 관념에 매이지 않고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그것이 ‘무아의 주체’로서 펼치는 능력이다. 동일성 관념에서 풀려난 ‘새로운 언어인간’이 ‘무아의 인간’이고, 그의 행보에서는 해탈·열반의 향기가 다채롭게 번져간다.>-언어인간의 길에 세워놓은 붓다의 향상 노정路程이다. ‘참 그대로인 진리[眞諦]’와 ‘세속적 관행에 따른 진리[俗諦]’가 <별개의 것이 아니다[不二]>라는 통찰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원효(617∼686)는 붓다의 이런 향상 노정을 따라 걷는 행보를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언어에 의지하여 ‘언어 환각이 사라진 도리[絶言之法]’를 드러내니, 마치 손가락에 의지하여 손가락을 떠난 달을 내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당신은 지금 오직 ‘말대로만 뜻을 취하고[如言取義]’ 말로 할 수 있는 비유를 끌어들여서 ‘언어 환각에서 벗어난 도리[離言法]’를 비난하니, 단지 손가락 끝을 보고 그것이 달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난이 정밀해질수록 도리를 잃어버리고 갈수록 멀어진다. … 보살이 만약 망상의 분별을 여의어 ‘[잘못된 분별로] 두루 헤아려 집착하는 양상[遍計所執相]’을 없애버리면, 곧 ‘언어 환각에서 벗어난 도리[離言之法]’를 드러내 비출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모든 현상의 ‘언어 환각에서 벗어난 양상[諸法離言相]’>이 나타난다. 마치 모양 있는 모든 양상을 제거해 버릴 때, 그 제거한 곳을 따라 모양을 여읜 허공이 나타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주3)
알아차림(정지正知, sampajānāti)과 언어 그리고 언하대오
“선지식들이여, 나는 홍인화상의 처소에서 ‘한 번 듣고 말 끝나자마자 크게 깨달아[一聞言下大悟]’ ‘참 그대로를 보는 본연의 면모[眞如本性]’에 ‘한꺼번에 눈 떴다[頓見]’.”(주4)
선종의 <말 듣자마자 크게 깨닫는다[言下大悟]>라는 말은 <말 듣자마자 돈오한다>라고 바꿀 수 있다. 선종에서 추구하는 깨달음[悟]은 돈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종의 돈오는 ‘마음 수행 맥락에서의 깨달음’이다. 붓다가 일러주고 선종이 계승하는 ‘마음 수행’은 ‘대상집중 수행’이 아니다. 또한 ‘이해 수행’과도 다른 내용이다. 이런 문제들은 이어지는 글에서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언하대오와 돈오견성이 ‘붓다가 설한 마음 수행 맥락에서의 깨달음’이라는 점만 언급해 둔다.
필자는 ‘마음 수행’과 관련하여 붓다의 법설 가운데 ‘육근수호六根守護 법설’을 특히 주목한다. ‘경험을 발생시키는 여섯 가지 감관능력을 잘 간수해 가는 방법에 관한 설법’이 육근수호 법설이다. <감관으로 만나는 ‘특징적 차이’(相, 전체적 차이나 세세한 차이)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는가에 따라 ‘무명의 길’과 ‘지혜의 길’로 그 행보가 갈라진다. 그리고 지혜의 길로 접어들기 위한 수행법의 핵심은 ‘알아차려 멈추어, 특징/차이들을 붙들고 쫓아가지 않는 마음 국면(正知, sampajānāti)’을 여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 수행의 요결이다.>-육근수호 법설의 요점이다. 이 육근수호의 도리를 설하는 언어를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언어가 지시하는 내용을 계기로 삼아, 문득[頓] ‘알아차려 멈추어, 특징/차이들을 붙들고 쫓아가지 않는 마음 국면’을 열면, 제대로 설법을 들은 게 된다. 붓다가 설한 선禪 행법의 요결을 체득하게 된다. 선종은 이 ‘마음 수행’을 <말 듣자마자 크게 깨닫는다[言下大悟]>라는 ‘돈오 국면 열기’로 계승하고 있다.
<‘사실 그대로를 왜곡하여 삶과 세상을 오염·훼손하는 길’과 ‘사실 그대로를 제대로 이해하여 삶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은, 신체적 감관(눈·귀·코·혀·몸)과 정신적 감관(의식)이 대면하는 ‘특징적 차이’(相, 대상, 경계)들과 관계 맺는 ‘마음 국면의 선택’(주5) 에 따라 결정된다.>-육근수호 법설의 길 안내다. <‘알아차려 멈추는 마음 국면’을 수립하면, ‘차이/특징들을 붙들고 쫓아 나가는 마음 행보’를 문득 쉰다.
이 멈춤은 ‘차이들의 왜곡과 오염 과정을 펼쳐가는 이해·사유·감정·행위와 그것을 이끄는 마음의 계열’에서 한꺼번에[頓] 빠져나오는 것을 뜻한다. 이 ‘알아차려 멈추어, 붙들고 쫓아가지 않으면서 차이/특징들을 만나는 마음 국면’을 지키면, 동일성 관념의 분별 그물이 범접犯接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알아차려 멈추어, 붙들고 쫓아가지 않으면서 차이/특징들을 만나는 마음 국면’을 챙겨, 놓치지 않도록 간수해 가라. 그러면 ‘생사의 차이로 인한 불안과 고통’ 등, ‘차이/특징들로 인한 속박과 동요, 불안과 괴로움의 파도’를 타면서도 그에 빠져들지 않는 자유와 평온의 안락이 생겨난다. 지지배배 새소리, 오가는 사람들, 온갖 냄새와 느낌을 만날 때, 바로 그때 그 자리 그것들에서, 쉬는 자리가 열린다. 그 쉬는 자리에서, ‘차이/특징들의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이해로 사유·감정·행위를 굴려, 삶과 세상을 두루 이롭게 만들어 함께 누려라.>-육근수호 법설의 요결要訣이다.
<‘언어로 시설되는 육근수호 법설’을 듣자마자, ‘지각되는 차이/특징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려 멈추어 붙들고 쫓아가지 않는 마음 국면’에 눈떠라. 그 ‘알아차려 멈추는 마음 국면’을 챙겨 지키면서 차이/특징들과 만나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이로움’을 누려라.>-<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면, 문득 ‘알아차려 멈추는 마음 국면’을 열게 된다.>-육근을 수호하는 마음 행법이다. <던지는 족족 물건을 쫓아 사방으로 달려가는 개가 되지 말고, 던지는 사람의 팔을 향해 달려드는 사자가 되어라. 소리를 듣는 자를 아는가? 차를 마시는 자를 아는가? 매일 보고 듣고 먹으면서도 모르는가?>-육근수호의 요결을 계승하고 있는 선종의 ‘곧바로 마음을 가리키는[直指人心]’ 선지禪指 언어이고, 그 ‘언어를 타고 나아가는 곳[落處]’이다. 문득 그곳으로 나아가면 ‘살게 하는 언어[活句]’가 되고, 말꼬리 잡고 이리저리 헤매면 ‘죽이는 언어[死句]’가 된다.
<사진>
(주1) 『맛지마 니까야』 「코끼리 자취에 비유한 큰 경(Mahā-hatthipadopama Sutta)」(M28)/대림 번역본 『맛지마 니까야』 제1권, p.682.
(주2) 『디가 니까야』 「뽓타빠다 경(Potthapāda Sutta)」(D9)/각묵 번역본 『디가 니까야』 제1권, pp.500-501.
(주3)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주4) 혜능, 『돈황본 육조단경』, “善知識, 我於忍和尚處, 一聞言下大悟, 頓見眞如本性.”
(주5) 붓다가 열고 선종이 계승한 마음 수행의 요점을 ‘마음 국면의 선택’이라는 말에 담아 보았다. ‘마음 국면의 선택’이 어떤 의미와 내용인지는 『선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상술되어 있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부설거사 사부시 강설
성철스님의 미공개 법문 4 부설거사浮雪居士 사부시四浮詩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모두 다 잘 아는 것 아니야? 지금까지 만날 이론만, 밥 얘기만 해 놓았으니 곤란하다 …
성철스님 /
-

봄빛 담은 망경산사의 사찰음식
사막에 서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렵고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 생각 달리해서 보면 사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무한한 갈래 길에서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누군가가…
박성희 /
-

운문삼구, 한 개의 화살로 삼관을 모두 뚫다
중국선 이야기 49_ 운문종 ❹ 운문종을 창립한 문언은 이미 조사선에서 철저하게 논증된 당하즉시當下卽是와 본래현성本來現成의 입장에서 선사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김진무 /
-

불교전파와 바다 상인들의 힘
기원전 1500~기원전 1000년경 쓰인 힌두교와 브라만교의 경전 『리그베다(Rig-Veda)』는 숭앙하는 신을 비롯해 당시 사회상, 천지창조, 철학, 전쟁, 풍속, 의학 등을 두루 다룬다. 베다에…
주강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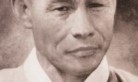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 ‘유심’과 ‘님의 침묵’ 사이
서정주의 시에 깃들어 있는 불교가 ‘신라’라는 장소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 『삼국유사』의 설화적 세계를 상상의 기반으로 삼는 불교라면, 한용운의 시에 담긴 불교는 ‘형이상학’이나 ‘초월’ 혹은 ‘공…
김춘식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