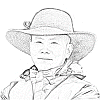[신행 길라잡이 ]
집중한다는 것과 업장소멸
페이지 정보
일행스님 / 2025 년 4 월 [통권 제144호] / / 작성일25-04-04 10:43 / 조회3,441회 / 댓글0건본문
질문1. 집중하는 힘에 대해
절과 능엄주를 일과로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 실수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인지 잡념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절과 능엄주가 익숙하게 된 지금, 다시금 내 안을 들여다보면 무수한 잡념이 들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절과 능엄주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인지력을 키워 가려고 노력했고,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을 어찌해야 할지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지만 확신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여전히 일어나는 잡념을 스스로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역부족임을 절감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 힘을 기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능엄주’라는 생소한 진언眞言 수행법을 선택하여 시작하게 되면 한동안 낯설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깊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효과가 있게 되지요. 하지만 그 방법에 익숙해지면 평소의 내 습習이 활발발하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방법에 대한 주의와 흥미가 사라지고, 내 의식이 전처럼 다시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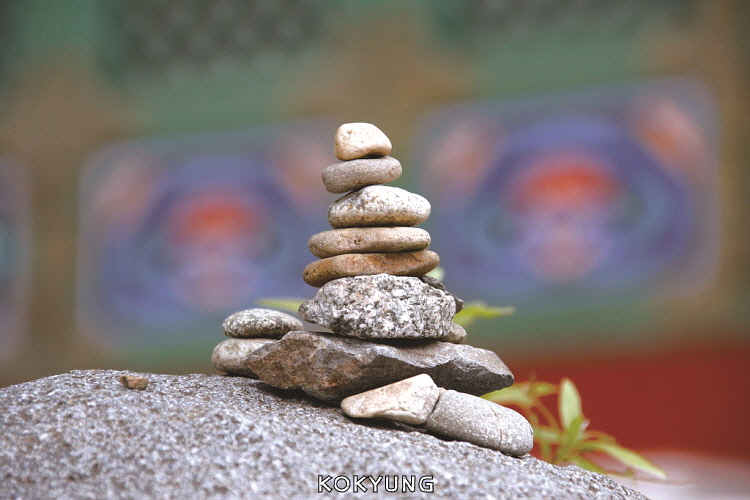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의식이 산만하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나 자신보다 늘 내 앞에 있는 대상들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소홀하니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관찰의 힘과 멈춤의 힘
밖의 대상에 가 있는 의식을 되돌려 나 자신에게 두기 시작하였을 때 비로소 자신의 현재 의식상태가 어떤지 보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 생각들이 잘 통제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산만한 의식 상태를 바로잡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집중하는 힘’[삼매력三昧力]을 가져야 합니다.
수행하는 이들이여, 삼매를 닦으라. 삼매를 닦으면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 『쌍윳따니까야』
삼매三昧를 닦아 삼매에 들면 두 가지의 힘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관찰의 힘’[관觀]과 ‘멈춤의 힘’[지止]입니다. 삼매라는 말이 일반화된 말이 아니어서 요즘은 쉽게 집중력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무엇의 집중인가 하면 마음을 ‘관찰하는 집중’이고, 그릇된 마음을 ‘멈추는 집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관찰해야 좋은 마음현상, 나쁜 마음현상을 알아차리고 식별해 낼 수 있습니다. 관찰이 돼야 증장增長시켜야 할 건 증장시키고, 그쳐야 할 건 그치려는 의지에 따른 조절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겠지요. 삼매(집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관찰의 심도深度와 세밀細密함이 커질 것이고, 통제하는 힘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참선, 진언수행법 등 자신이 선택한 수행법을 통하여 이렇듯 삼매력을 점점 더 깊이 확보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삼매력의 깊이 정도를 나타내는 ‘공부 삼분단三分段’이 있습니다. 동중일여動中一如, 몽중일여夢中一如, 숙면일여熟眠一如가 그것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집중의 맛을 느끼면서 그 과정상에서 이런 집중 수준의 변곡점이 있음을 참조하여 더욱 자신을 분발하는 척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은 늘 움직인다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움직임을 잘 알아차리는 ‘싸띠(sati)’를 하면서 명상주제(예컨대 화두참선에서는 화두를, 진언수행에서는 진언의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의식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감感이 잡히는 게 있더군요. 물론 그러한 게 경전經典과 어록語錄을 통해 그에 따른 스승의 가르침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해보니 어느 정도는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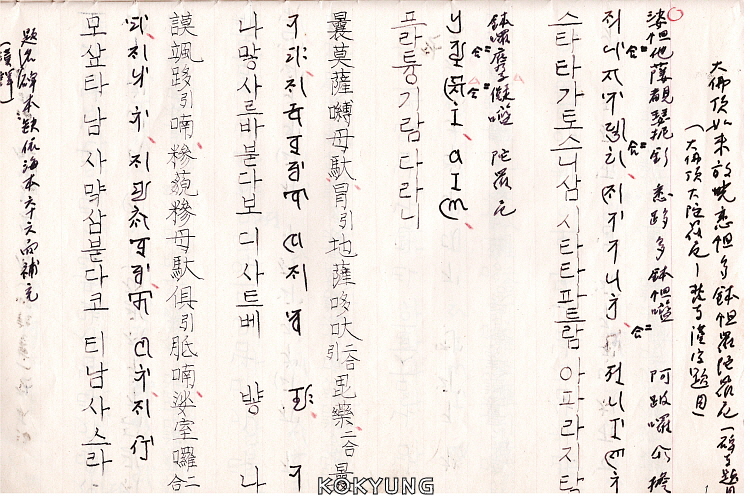
그리고 ‘일어나는 잡념’ 운운하셨는데, 사실 마음은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늘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잠자고 있는 동안은 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깊은 의식은 정신의식에게 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깊은 의식에는 ‘업業’이라는 정보가 무진장 들어 있는데, 이 업이 일종의 성향으로써 활동식活動識인 정신의식에게 제공됩니다.
싸띠라는 마음챙김을 하고 있으면 고요한 속에서도 툭툭 올라오는 생각의 정보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잘못된 마음현상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작용인 셈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올라오는 생각의 정보들 때문에 의식이 산만해진다든가, 휘둘린다든가, 끄달린다든가 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일종의 잡념雜念에 영향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지요. ‘업業’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업으로 인해 장애障碍를 받는다는 것, 즉 ‘업장業障’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집중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도하지 않게 올라오는 생각의 정보를 막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오롯이 둘 수 있게 하도록 하는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세요
진언수행을 하신다 하니 진언수행법으로 잠시 더 언급하겠습니다.
능엄주를 하면서 내가 듣는 능엄주 소리에 마음을 모으세요. ‘내는’ 소리가 아닌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세요.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하라는 이유는 그래야 의식이 지금 여기 있는 자신에게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나가는 소리에 집중하면 의식이 바깥으로 가는 상태가 됩니다. 의식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게 되지요.
음音 하나하나가 명료해지도록 들어야 하고, 이렇게 듣다 보면 나중에 듣는다는 것보다는 소리를 본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무조건 빨리 하려는 마음을 내지 말고, 음을 또박또박 그리고 선명하게, 속도는 익숙해진 만큼의 자연스러운 속도로 내야 합니다.
음音을 듣는다는 것이 마치 집안에서 문을 열고 ‘소리’라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현재 내 의식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수행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짧게보다는 가늘더라도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바위에 구멍을 뚫어내지요.
질문2. 업장소멸에 대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제대로 못 하는 건지 여전히 사는 것이 고달픈 저 자신을 느낄 때마다 ‘몸은 고달파도 마음만이라도 좀 편안해야 할 텐데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보통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분들이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 기도를 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들은 기억으로는 업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런데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요?
답변
고달프게 느껴지는 삶. 비단 질문하신 분만이 아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 고달픔은 때론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감성에 젖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약함으로 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강한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비와 애벌레의 차이
부처님 말씀에 “정해진 업은 면할 수 없다[정업불면定業不免].”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장業障은 소멸된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업장은 소멸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때요?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 않나요? 정해진 업은 면제될 수 없다면서 또 업장은 소멸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부처님께서 모르고 이렇게 맞지 않게 말씀을 하셨을 리는 없을 테고, 그렇다면 서로 반대되는 듯한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비 유충이 알에서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비유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비 유충이 알에 있을 때도 ‘나는 나’입니다. 알에서 깨어나와 애벌레로 기어다닐 때도 ‘나는 나’입니다. 실을 뿜어 집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앉아 고치로 있을 때도 ‘나는 나’입니다. 고치의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닐 때도 ‘나는 나’입니다. 알에 있을 때부터 나비가 되기까지, 그 어느 과정에 있든 ‘나는 나’입니다. 그렇지요?
알에 있을 때도 세상은 같은 세상입니다. 애벌레로 기어다닐 때도 세상은 같은 세상입니다. 고치로 있을 때도, 나비가 되어 날아다닐 때도 세상은 같은 세상입니다. 내가 알로 있을 때나, 애벌레로 있을 때나, 고치로 있을 때나, 나비가 되어 날아다닐 때나, 내가 속한 세상은 여전히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같은 세상이지만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알에 있든, 애벌레로 있든, 고치로 있든, 나비로 있든 나는 나이지만 그 내가 인식하는 세상은 같지가 않습니다. 애벌레의 수준에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세상과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의 수준에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세상은 같은 세상일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과 공간이지만 나에게 인식되는 시간과 공간은 정신적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옵니다. 애벌레일 때는 수많은 시간을 기어서 가는 거리를, 나비일 때는 단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그 ‘나’가 차원을 달리했을 때 같은 세상이지만 또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정해진 업을 피하지 못하고 받더라도 그 형태와 내용은 바뀌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백 년을 걸려 가는 거리를 나비는 하루 만에 가는 것처럼. 이것이 “정해진 업은 면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 또한 “업장은 소멸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혹 내가 애벌레의 수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늘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또 다른 세상을 접하고 살 수 있는 ‘나’로 만들기 위해 애써야겠지요.
기도수행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정해진 업을 피할 수 없는 나’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차원이 다른 나’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때는 ‘업장이 소멸되는 나’가 될 것입니다.
기운 내세요.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니까요.
※정림사 일행스님의 글을 더 보실 분은 https://cafe.daum.net/jeonglimsarang을 찾아주세요.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카일라스산 VS 카일라사 나트
『고경』을 읽고 계시는 독자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필자는 히말라야의 분수령에 서 있다. 성산聖山 카일라스산을 향해 이미 순례길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의 앞다리는 티베트의 땅을 …
김규현 /
-

기후미식의 원형 사찰음식
사찰음식은 불교의 자비와 절제,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해치지 않고도 풍요를 느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음식 문화입니다. 인공조미료나 육류를…
박성희 /
-

동안상찰 선사 『십현담』 강설⑧ 회기迴機
성철스님의 미공개 법문 12 회기라! 기틀을 돌린다고 해도 괜찮고, 돌려준다고 해도 괜찮고, 경계에서 한 바퀴 빙 도는 셈이야. 열반성리상유위涅槃城裏尙猶危&…
성철스님 /
-

소신공양과 죽음이 삶을 이기는 방법
만해 선생이 내 백씨를 보고,“범부, 중국 고승전高僧傳에서는 소신공양燒身供養이니 분신공양焚身供養이니 하는 기록이 가끔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아…” 했다.내 백씨는 천천히 입을 …
김춘식 /
-

법안문익의 오도송과 게송
중국선 이야기 57_ 법안종 ❹ 중국선에서는 선사들의 게송偈頌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본래 불교는 십이분교十二分敎(주1)로 나누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운문韻文에 해…
김진무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