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삼국의 선 이야기 ]
운문삼종병雲門三種病
페이지 정보
김진무 / 2025 년 7 월 [통권 제147호] / / 작성일25-07-05 11:09 / 조회1,173회 / 댓글0건본문
중국선 이야기 52_ 운문종 ❼
운문종을 창시한 문언의 선사상은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그의 선사상은 남종선과 그 이전에 출현한 조사선의 사상적 근거인 당하즉시當下卽是와 본래현성本來現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문언은 ‘무사無事’를 언급하고, ‘의심즉차擬心即差’를 강조하였으며, 운문의 독특한 일자관一字關을 제시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상은 바로 ‘운문삼구雲門三句’에 함축되어 학인의 제접提接에도 운용되었다고 하겠다. 운문종은 비록 송대 이후에 점차 그 세력이 약해졌지만, 오대와 북송대에서는 오히려 오가五家 가운데 가장 번성한 조사선이었다. 그에 따라 후대에 운문종의 종지와 종풍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인천안목』에 나타난 운문종의 종지 종풍
남송대에 오가의 종지와 종풍을 논한 『인천안목』 권2에는 운문종의 특징을 운문삼구雲門三句와 관련된 다양한 게송을 소개하고 있으며, 일자관一字關과 강종게綱宗偈 등을 싣고 있으며, 끝부분에 ‘운문문정雲門門庭’의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운문종의 종지宗旨는 모든 흐름을 단절한다. 생각할 여지도 주지 않으며, 범부와 성인의 길이 막혀 있고, 정견情見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 대략 운문종의 종풍宗風은 고고하고 험준하여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렵도다. 상상上上의 근기根器가 아니라면 누가 그 대강大綱조차 엿볼 수 있겠는가? 운문의 어구語句를 살펴보면 비록 흐름을 끊는 기틀은 있으나 결코 물결에 따르는 뜻은 없노라. 법문法門은 비록 다를지라도 이치는 한결같이 돌아간다. 운문을 보고자 하는가? 주장자가 꿈틀대며 하늘로 솟구치고, 찻잔 속에서 모든 부처가 설법하리라!(주1)
이러한 논술로부터 운문종의 사상은 결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선리禪理를 제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흐름을 끊는 기틀은 있으나 결코 물결에 따르는 뜻은 없노라.”라는 문구로부터 운문삼구의 ‘절단중류’를 인정하면서도 ‘수파축랑’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운문종의 선사상 자체가 지니는 난해함을 지적하는 의도라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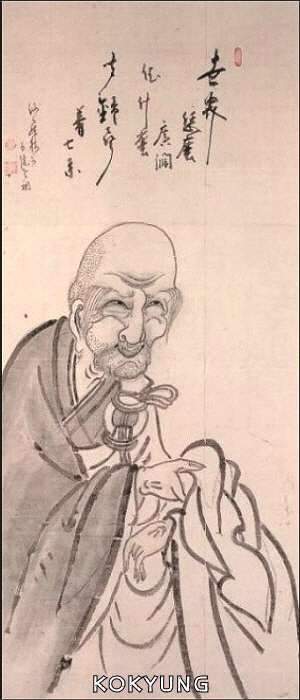
특히 문언이 제창한 ‘일자관’으로부터 다양한 선문답에는 결코 쉽게 방하착放下著할 수 없는 난해함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이러한 운문선의 난해함이 운문종이 임제종이나 조동종보다 단명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주장자가 꿈틀대며 하늘로 솟구치고, 찻잔 속에서 모든 부처가 설법하리라!”라는 운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인천안목』에서 인용한 운문종의 ‘요결要訣’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격외格外로 놓아 주었다 잡았다 하며 말하기 전에 반드시 빼앗으니 다만 칼끝에 길이 있고, 철벽에 문이 없는 경계이며, 칡덩굴과 등나무로 뒤엉킨 길을 치고 뒤집어 상정常情의 견해를 잘라 버린다. 맹렬한 불꽃도 다가서지 못하고, 번개 같은 빠름은 사량思量이 미처 따를 수 없다. 그 진리를 보는 안목이 넓고 통달하므로, 저절로 그 쓰임 또한 크고 넓다. 꽃은 영수靈樹에서 피었고, (선사의) 제자인 향림징원香林澄遠에게서 열매를 맺었으니, 불조佛祖의 권형權衡을 떨치고, 인천人天의 안목眼目을 열었다. … 이것이 운문종의 종풍宗風이다.(주2)
여기에서도 운문종의 활달하면서도 날카로운 선기禪機를 지적하고 있으며, 문언이 지성여민知聖如敏으로부터 영수사靈樹寺의 주지를 물려받아 개당開堂하여 운문종이 시작되었고, 문언의 제자인 향림징원이 운문종을 널리 알렸음을 밝히고 있다.
『오가종지찬요』의 ‘운문종지송’
청대 성통이 찬술한 『오가종지찬요』에는 다음과 같은 ‘운문종지송雲門宗旨頌’이 실려 있다.
목주睦州의 화로와 설봉雪峰의 기틀,
금빛털 사자 새끼를 두들겨 완성하였도다.
삼구三句를 본보기로 삼아 법칙法則을 나누고,
열 가지 문을 따라 근기에 맞게 가르치네.
나무는 시들고 잎은 떨어지며 서풍이 급하게 불고,
구름은 엷고 하늘은 낮으며 저녁 해는 더디게 지네.
정견情見으로는 끝내 엿볼 수 없으니,
심의식心意識을 떠나야 비로소 알 수 있으리.(주3)

이러한 성통의 게송에서 운문종을 창립한 문언이 목주도종睦州道踪과 설봉의존雪峰義存을 통하여 이른바 금모사자金毛獅子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금모사자’는 바로 조사선에서 궁극적인 선리를 깨달은 이를 뜻하는 것이니, 문언이 바로 도종과 의존을 통해 깨달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게송에서는 ‘운문삼구’가 운문종의 사상적 특질이라고 파악함을 엿볼 수 있다.
『오가종지찬요』의 ‘운문삼종병’
그런데 성통의 『오가종지찬요』의 운문종 항목에 ‘운문삼종병’이라는 항목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운문삼종병雲門三種病
(움직임과 멈춤 모두 세 가지 병에서 비롯되니, 치우치거나 메마르면 양변兩邊에 떨어진다.)
1.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기는 병[未到走作]
그림자를 피하며 몸만 고생할 뿐, 진실한 곳은 없구나.
어둠[陰]을 피하고 자취를 없애려 하나, 헛된 수고일 뿐이네.
삼산三山의 게송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와도 끝이 없고,
남쪽으로 달리고 북쪽으로 가도 어느 해에나 이를 것인가?
붉은 먼지[紅塵] 속에서 어지럽게 살아 돌아갈 길을 잊었고,
꿈이 끊긴 고향 산천, 참으로 가엾도다.
2. 도달했으나 거기에 머무는 병[已到住著]
운 좋게 있음[有]을 버리고 돌아보게 되었으나,
이제는 공空에 빠져 몸을 돌리지 못하노라.
삼산의 게송
장안長安이 즐겁다 하나, 실상 살기 어려운 곳!
어디를 가도 한가롭게 펼치고 접는다.
제발 문 닫고 높은 베개 베고 누워 있지 말 것이니,
병을 키워 오래 묵히면 누가 그것을 없애 주겠는가?
3. 벗어났으나 의지할 곳 없는 병[透脫無依]
남쪽으로 달리고 북쪽으로 가도 머무를 바가 없고,
하루종일 한가롭게 떠돌지만 집에는 이르지 못하네.
삼산의 게송
세속의 감옥[塵牢]에 들어가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으나,
족쇄를 벗고 자물쇠를 부순 지도 이미 여러 해.
이 사람이 끝없는 떠돌이가 되리란 걸 누가 알았겠는가?
막막히 의지할 곳 없이 떠돌며 돌아오지 않는구나.
고존숙古尊宿의 총송總頌
고향 산천엔 안개와 물이 가을빛인데,
집에 도착하고서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의지無依止에 이르면,
이 병은 염라대왕도 너 대신 걱정해 줄 정도일세!(주4)

비록 장문을 인용했지만, 게송의 내용이 좋아서 줄이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였고, ‘삼산三山’은 바로 성통性統이다. 이러한 내용의 삼종병은 『운문광록』에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운문광록』에는 다음과 같이 현사玄沙의 ‘삼종병’을 언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현사玄沙를 들어 시중示衆하여 말했다. “제방諸方의 노존숙老尊宿들이 중생을 접화接化하여 이롭게 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홀연히 세 종류의 병든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그들을 접화하겠는가? 눈먼 자가 오면,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불자拂子를 세워도 그는 보지 못하고, 귀먹은 자가 오면, 언어言語 삼매三昧로 말해도 그는 듣지 못하며, 말을 못 하는 자가 오면, 그에게 말하라 해도 말하지 못한다. 이들을 어떻게 접화하겠는가? 만약 이 사람들을 접화하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법에는 영험靈驗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때 한 승려가 나아가 가르침을 청하니, 선사가 말하였다. “예배하라.” 승려가 예배하려고 일어나자, 선사는 주장자로 곧바로 찔렀고, 승려는 물러났다. 선사는 “너는 눈먼 자가 아니구나.”라고 하였다. 다시 가까이 오라고 부르자, 승려가 가까이 다가오니, 선사는 “너는 귀먹은 자도 아니구나.”라고 하였고, 지팡이를 들어 보이며 “알겠느냐?”라고 하자 승려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선사는 “너는 벙어리도 아니구나.”라고 하였고, 그 승려는 이 말에서 깨달음을 얻었다.(주5)

이는 원오극근圓悟克勤의 『벽암록碧巖錄』 88칙則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운문광록』에는 성통이 논한 위의 ‘운문삼종병’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대元代 만송행수萬松行秀의 『종용록從容錄』 권1의 제11칙 ‘운문양병雲門兩病’에는 이 내용이 보인다. 그에 따르면, 조동종을 창립한 동산양개洞山良价의 제자인 월주건봉越州乾峯으로부터 문언이 이 ‘삼종병’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주6) 물론 『운문광록』에는 건봉으로부터 ‘삼종병’을 들었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성통이 논한 삼종병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주7) 따라서 성통이 언급한 ‘운문삼종병’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게 문언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출처는 아마 『종용록』이라고 추정된다.
운문종에 대한 역대의 평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난다. 그것은 운문종의 선사상이 조사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인천안목』과 『오가종지찬요』에 실려 있는 운문종의 평가 가운데 중요한 내용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각주>
(주1) [宋]智昭集, 『人天眼目』 卷2(大正藏48, 313a-b), “雲門宗旨, 絕斷衆流. 不容擬議, 凡聖無路, 情解不通. …… 大約雲門宗風, 孤危聳峻, 人難湊泊. 非上上根, 孰能窺其彷彿哉? 詳雲門語句, 雖有截流之機, 且無隨波之意. 法門雖殊, 理歸一致. 要見雲門麼? 拄杖子o跳上天, 盞子裏諸佛說法!”
(주2) 앞의 책(大正藏48, 313b), “格外縱擒, 言前定奪, 直是劍峰有路, 鐵壁無門, 打飜路布葛藤, 剪却常情見解, 寧烈焰容湊泊, 迅雷不及思量. 蓋其見諦寬通, 自然受用廣大. 花開靈樹, 子結香林, 振佛祖權衡, 開人天眼目. …… 此雲門宗風也.”
(주3) [淸]性統編, 『五家宗旨纂要』 卷3(卍續藏65, 281c), “雲門宗旨頌: 睦州爐鞴雪峰機, 打就金毛獅子兒. 三句楷磨區法則, 十門規度別機宜. 樹凋葉落西風急, 雲淡天低晚日遲. 情見到頭窺不得, 離心意識始方知.”
(주4) 앞의 책(卍續藏65, 280c), “雲門三種病(動止因三種, 偏枯落二邊): 一.未到走作. 避影勞形無是處, 離陰滅跡枉徒然. 三山來頌云: 東去西來無了日, 南奔北走到何年. 紅塵擾擾忘歸路, 夢斷家山實可憐. 二.已到住著. 幸然棄有方回首, 却便沉空不轉身. 三山來頌云: 長安雖樂實難居, 到處優游任卷舒. 莫教閉門高枕臥, 養成痼疾倩誰除? 三.透脫無依. 走南進北無方所, 盡日優游不到家. 三山來頌云: 不入塵牢不受纏, 拋枷打鎖許多年. 誰知作箇長流客, 蕩蕩無依去不還. 古尊宿總頌: 未到家山烟水秋, 歸來那更不回頭. 就中透得無依止, 此病閻王替汝愁.”
(주5) [宋]守堅集, 『雲門匡眞禪師廣錄』 卷中(大正藏47, 560a), “舉玄沙示眾云: 諸方老宿盡道接物利生, 忽遇三種病人來, 作麼生接? 患盲者拈槌竪拂他又不見, 患聾者語言三昧他又不聞. 患瘂者教伊說又說不得, 且作麼生按? 若接此人不得, 佛法無靈驗. 有僧請益師, 師云: 爾禮拜著. 僧禮拜起, 師以拄杖便挃, 僧退後. 師云: 爾不是患盲. 復喚近前, 僧近前. 師云: 爾不是患聾. 乃竪起拄杖云: 還會麼? 僧云: 不會. 師云: 爾不是患瘂. 其僧於此有省.”
(주6) [宋]正覺頌古, [元]行秀評唱, 『萬松老人評唱天童覺和尚頌古從容庵錄』卷1(大正藏48, 234b), “師云: 越州乾峯和尚, 法嗣洞山悟本, 雲門遍參曾見師與曹山疎山. 此則公案先有來源, 乾峯示眾云: 法身有三種病二種光. 이하 생략.”
(주7) [宋]守堅集, 『雲門匡眞禪師廣錄』 卷下(大正藏47, 574c), “師因乾峯上堂云: 法身有三種病二種光, 須是一一透得, 更須知有照用臨時向上一竅在.”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네팔 유일의 자따까 성지 나모붓다 사리탑
카트만두에서 남동쪽으로 52km 떨어진 바그마띠(Bagmati)주의 까브레빠란 삼거리(Kavrepalan-Chowk)에 위치한 ‘나모붓다탑(Namo Buddha Stupa)’은 붓다의 진신사리를 모…
김규현 /
-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
올 초 백련불교문화재단과 BTN 불교TV는 성철 종정예하께서 “부처님께 밥값했다.”라고 하시며 흔연히 펴내신 『선문정로』의 저본이 되는 큰스님의 육성 녹음을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원택스님 /
-

잊혀진 불국토의 섬 몰디브
많은 한국인이 몰디브로 여행을 떠난다. 코발트 빛 해안으로 신혼부부들을 이끈다.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26개의 환초로 이루어지는데 섬의 총수가 무려 2,000여 개(1,192개)에 달한다고 한다. …
주강현 /
-

운문종의 법계와 설숭의 유불융합
중국선 이야기 53_ 운문종 ❽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던 당조唐朝가 멸망하고, 중국은 북방의 오대五代와 남방의 십국十國으로 분열되었다. 이 시기에 북방의…
김진무 /
-

초의선사의 다법과 육우의 병차 만들기
거연심우소요 58_ 대흥사 ❻ 초의선사의 다법을 보면, 찻잎을 따서 뜨거운 솥에 덖어서 밀실에서 건조시킨 다음, 이를 잣나무로 만든 틀에 넣어 일정한 형태로 찍어내고 대나무 껍질…
정종섭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