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
명종대 선교양종의 복립을 둘러싼 갈등
페이지 정보
이종수 / 2025 년 11 월 [통권 제151호] / / 작성일25-11-05 10:19 / 조회21회 / 댓글0건본문
태종대부터 중앙 정치 무대에서 불교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세종대까지 국가 공인의 종파는 7종에서 2종(선종과 교종의 양종)으로 축소되었고, 국가 관리의 사원 역시 242사寺로 제한되었다가 세종대에 이르러 36사로 축소되었다. 중앙 행정부서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승록사僧錄司는 폐지되고 양종 도회소都會所가 설립되어 예조의 통제를 받았다.
불교의 권한 축소와 도성출입금지
이러한 체제는 성종대까지 대체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승려 관리를 선발하던 승과僧科도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연산군대와 중종대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연산군 말기에 도성 안에 있던 선종 본사인 흥천사와 교종 본사인 흥덕사가 화재로 소실된 후 선교양종에 관한 업무는 도성 밖 청계사로 이관되었고 도성 안에는 승려들이 거주하는 사찰들이 남아 있지 않았다. 중종대에 이르러서는 국가 공인의 선교양종 및 승과를 폐지하고 승려의 도성출입금지를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서 명문화하였다.
대사헌 김전·대사간 이세인 등이 올린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종을 혁파하여 부서府署를 만들었고 승려들이 시가市街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자, (환속하여) 머리를 기르고 군사에 편입하는 자가 10명이면 8∼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신재 같은 작은 일을 고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형세인데도, 여러 달을 엎드려 아뢰어도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신들의 통분하고 한탄스러워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
- 『중종실록』 4년(1509) 8월 23일.

양종을 혁파한 날짜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와 관련하여 『실록』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기록은 1509년(중종 4) 1월 19일에 유사경이 임금에게 “지금 양종을 이미 혁파하였는데도 그 세稅는 그대로 있으니, 신의 생각에는 사사寺社의 전세田稅를 모두 폐지하여 군자軍資에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아뢴 내용이다. 이때 중종은 유사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이 기록을 통해 양종이 이미 혁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서 사헌부의 관리들이 양종 혁파와 도성출입금지의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기신재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결국 중종은 대신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1516년(중종 11) 6월 2일에 이르러 기신재忌晨齋의 혁파 명령을 내린다.
이때 중앙 권력에서 불교의 정치적 권력과 신앙적 의식이 완전히 퇴출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중종을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명종을 대신해 문정왕후(중종의 세 번째 왕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유학을 신봉하는 대신과 불교를 신앙하는 왕실 사이에 최후의 일전이 벌어졌다. 문정왕후와 대신의 본격적인 갈등은 지방의 왕실 원당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중앙과 지방에 있는 큰 절은 내원당이라고 지목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려 70곳이나 되어 금지 푯말이 산마다 있으니, 새로 정치하시는 임금에게 누累가 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성지聖旨를 밝게 내리어 중앙과 지방에 있는 모든 절의 내원당이란 이름을 일체 없애고 금지 푯말을 아울러 철거하게 하소서.” 하였다. … 한 달이 넘게 논계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 『명종실록』 5년(1550) 3월 11일.
대신들이 지방의 왕실 원당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문정왕후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원당을 지정할 때 3곳의 사찰이 빠졌다면서 추가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훗날 실록을 편찬한 사관史官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당초 금지 푯말을 세울 때 단지 내지內旨라고만 칭하여 조정은 알지 못했었다. 지금은 예조로 하여금 팔도에 공문을 보내 한잡인閑雜人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니, 실로 부처를 받드는 뜻을 전국에 보인 것이다. … 전일에 적어서 내린 78개의 사찰도 그 수가 오히려 많은데, 또 더 적어 넣도록 명하였으니, 부처를 숭봉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도 독실한가.
- 『명종실록』 5년(1550) 3월 19일.
유학을 신봉하는 대신과 불교를 신앙하는 문정왕후의 대립
선교양종의 폐지와 함께 세종대에 지정한 36사에 대한 재정 지원도 끊어졌지만 이때에 이르러 전국 명산대찰을 원당으로 삼아 우회적으로 지원하면서 대신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이다. 대신들은 몇 차례 상소를 올리며 원당 지정을 반대하였으나 문정왕후의 강경한 태세에 한 발 물러서며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 문정왕후는 새로운 명을 내린다.
자전(문정왕후)이 상진에게 내린 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 “… 백성들이 4~5명의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군역의 괴로움을 꺼려서 모두 도망하여 승려가 되는데, 이 때문에 승려는 날로 많아지고 군액軍額은 날로 줄어들니 매우 한심스럽다. … 『경국대전』에 선종과 교종을 설립해 놓은 것은 불교를 숭상해서가 아니라 승려 되는 길을 막고자 함이었는데, 근래에 혁파했기 때문에 폐단을 막기가 어렵게 되었다. 봉은사와 봉선사를 선종과 교종의 본산으로 삼아서 『경국대전』에 따라 「대선취재조大禪取才條」 및 승려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신명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명종실록』 5년(1550) 12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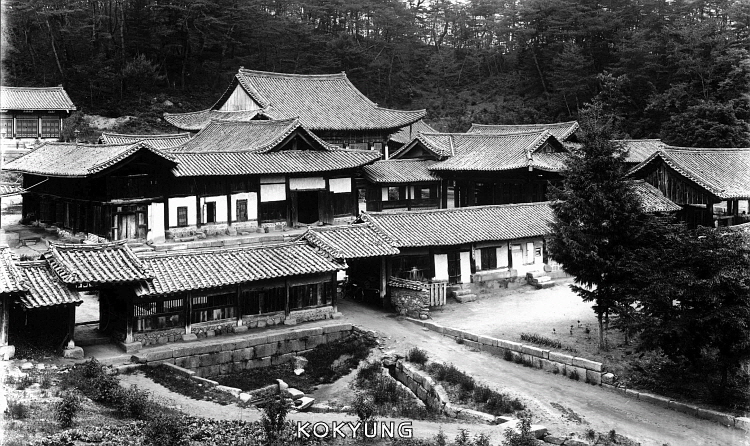
문정왕후는 우의정이었던 상진에게 선교양종을 복립하라고 명하였다. 상진은 비교적 문정왕후에게 우호적인 재상이었지만, 선교양종의 복립을 찬성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하며, “민정民丁으로서 군역을 도피하는 자들은 거의가 승려가 됩니다. 오늘날 군액이 줄어드는 것이 모두가 이 때문이며 심지어 도둑으로 잡히는 자들 가운데 승려가 그 반을 차지합니다. 만일 이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막기 어려운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상진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로부터 1551년(명종 6) 6월 25일에 ‘보우普雨를 판선종사도대선사判禪宗事都大禪師 봉은사 주지로, 수진守眞을 판교종사도대사判敎宗事都大師 봉선사 주지’로 삼을 때까지 『명종실록』에 기록된 관청과 신하들의 반대 건수가 258회에 이른다.
먼저 양사(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반대를 나타낸 기록이 126회 나오고, 이어서 홍문관에서 반대한 것이 32회이다. 양사는 임금을 찾아가 3~4번 반대를 청하였으나 그때마다 거절당하였고, 홍문관에서는 차자箚子를 올려 요청하였으나 역시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양사가 양종과 선과를 다시 설치하지 말 것을 아뢰었다. 네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명종실록』 6년(1551) 1월 14일.
홍문관이 상차하여 양종과 선과를 다시 설치하는 일에 대해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명종실록』 6년(1551) 1월 15일.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묵살되자, 성균관 유생들이 나섰다. 유생들은 30회에 걸쳐 상소를 올려 선교양종 복립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성균관 유생들은 학교를 떠났다.

태학의 유생들이 공자묘에 절한 후에 학관을 비우고 떠나갔다. 성균관 관원이 그 사실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단을 배척하는 것은 유자의 일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말로 인하여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할 수는 없으니 학관에 나와 가슴속의 하고 싶은 말을 다하도록 하라.’고 유시諭示하라.” 하였다.
- 『명종실록』 6년(1551) 1월 21일.
문정왕후는 8차례 관료를 보내 유생의 복학을 설득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성균관 유생들에 이어 양사의 관원들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역시 9차례 그들을 불러 설득하였으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복직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개성부 유생들도 동참하여 6회에 걸쳐 상소를 올렸다. 이러한 가운데 임금의 비서실이라 할 수 있는 승정원에서도 8회에 걸쳐 반대 의사를 아뢰었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근일 양종과 도승度僧에 관한 일 때문에 대간과 시종이 엎드려 절하며 교대로 글을 올리고, 심지어는 관학의 유생들까지 연일 상주하는데, 임금께서는 이렇듯 망설이시니 신들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신들뿐만 아니라 중외의 신료들도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 하였다.

승정원의 요청도 거부되자, 의정부와 육조의 대신들이 모두 나아가 간언하기를 3회 하였고, 좌의정 심연원이 13회, 영의정 이기가 2회, 우의정 상진이 2회에 걸쳐 대신들과 함께 나아가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받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예문관 14회, 내금위 2회, 승문원·통례원·교서관·충의위 각 1회 차자를 올렸다. 또한 성균관 사성 남응룡이 3회, 봉상지 민정이 2회, 우찬성 김광준이 2회에 걸쳐 아뢰었고, 시강관 윤옥, 충훈부 도사 정현, 성균관 대사성 주세붕, 예빈시 김개, 환관 성윤, 경기관찰사 채세영과 도사 안방경, 개성유수 정유선, 겸사복 김복린, 좌참찬 임권 등이 각 1회 건의하였다.
선교양종 복립과 승과의 실시
신하들은 수백 번에 걸쳐 선교양종 복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거부당하자, 문정왕후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고 있던 승려 보우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다. 함경어사 왕희걸이 먼저 글을 올려 아뢰었다. 그 내용은 “보우가 함경도 안변 황룡사 초암에 살 적에 역적 이유를 숨겨주었는데, 이유가 붙잡히자 함흥 백운산으로 피해 달아난 적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문정왕후는 다음과 같이 하교하였다.
전교하기를, “봉은사는 성종 대왕의 능침을 수호하는 절로 보우가 직무를 능히 감당할 만하다고 여겼으므로 주지로 삼았다. 경연에서나 상소·차자 가운데 이를 말한 자가 많고 소수서원의 유생들이 올린 상소에서 ‘전하께서는 보우를 높이고 자전은 불교를 숭상함으로써 풍년들게 하려 한다.’ 하였으나 이것은 모두 근거없는 말이다. 봉은사의 주지는 승려들이 다 경쟁하고 탐내는 자리여서 많은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 하였다. 이는 함경어사 왕희걸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하교한 것이다.
- 『명종실록 6년(1551) 4월 13일.
왕희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도 보우의 처벌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사헌부에서 먼저 2회 아뢰었으나 거부당하자, 양사가 합동으로 보우의 처벌을 37회 요구하였고, 홍문관에서도 24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그 모든 요구를 거절하고 1551년 6월 25일에 보우를 판선종사 및 봉은사 주지, 수진을 판교종사 및 봉선사 주지에 임명하였다. 이로써 선교양종의 복립을 둘러싼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실록』에서 사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신은 논한다. … 보우 등은 품계 높은 관원으로 자처하여 머리에는 옥관자요 허리에는 붉은 띠를 두르고 있다. … 모든 산의 승려들이 임금처럼 우러러보며 달려 나가 맞이하고 보내기를 감히 조금도 어기지 못하며 승왕僧王이라 하였다. … 온 나라의 장정들을 전국의 산사로 몰아서 간사한 승려를 받들게 하고, 자잘한 일까지 모두 궁궐을 통하게 하고 있으니 그 말류의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 『명종실록』 6년(1551) 6월 25일.
문정왕후와 보우는 고집스럽게 대신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선교양종을 복립하고 승과를 다시 실시하였다. 새로 실시한 첫 번째 승과에서 장원급제한 승려가 서산대사 청허휴정이다. 그 이후 승과에 합격한 많은 승려들 역시 훗날 임진왜란 의승장으로 참전하였다. 그야말로 문정왕후와 보우는 침체되어 가던 불교계에 등불을 밝힌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우 그 자신은 1565년 5월 문정왕후가 승하한 이후 제주도로 유배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히말라야를 넘나들었던 신라의 순례승들
2001년 케룽현에서 4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종까마을에서 국보급 가치가 있는 고대석각古代石刻이 발견되어 중국 고고학계를 흥분시켰던 일이 있었다. 바로 〈대당천축사출명〉이란 비문(주1)이다. 이 …
김규현 /
-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光陰莫虛度]
중국선 이야기 56_ 법안종 ❸ 법안종을 세운 문익은 청원계를 계승한 나한계침羅漢桂琛의 “만약 불법을 논한다면, 일체가 드러나 있는 것[一切現成]이다.”라는 말로부터…
김진무 /
-

신라 말의 정치적 혼란과 선법의 전래
태안사 ❶ 태안사泰安寺는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에 있다. 죽곡면에서 태안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태안사 계곡으로 접어들어가면 동리산桐裏山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정종섭 /
-

불생선의 주창자 반케이 요타쿠
일본선 이야기 23 동아시아에서 유교와 불교는 실질적인 경쟁자이자 동반자다. 유교는 불교로 인해 내면세계를 더욱 강화했고, 불교는 유교로 인해 현실 감각이 깊어진다.…
원영상 /
-

『성철스님의 백일법문과 유식』 출간 외
서종택 시인의 책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걷습니다』 봉정식 서종택 시인의 선禪 에세이집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걷습니다』 출간 기념 봉정식이 지난 9월 20일 대구 정혜사 문수전에서 열…
편집부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