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와 빛의 말씀]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없다
페이지 정보
성철스님 / 2024 년 11 월 [통권 제139호] / / 작성일24-11-05 12:10 / 조회536회 / 댓글0건본문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二由一有 一亦莫守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변견은 하나 때문에 나며 둘은 하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마저도 버려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알았다 해도 중도가 따로 하나 존재한다고 하여 여기에 집착하면 병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때문에 둘이 있으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고 버려라, 곧 중도마저도 버려라 하였습니다. 중도는 무슨 물건이 따로 존재하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변을 떠나서 융통자재한 경지를 억지로 표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 없느니라.
一心不生 萬法無咎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만법이 원융무애하여, 아무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융통자재를 말한 것으로서 사사무애事事無碍·이사무애理事無碍의 무장애법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어디서 성립되느냐 하면 바로 양변을 여읜 중도에서 성립됩니다. 즉 시비심의 두 견해를 버리고, 하나마저도 버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 생각도 나지 않고 일체 만법에 통달무애한 무장애법계가 벌어져 일체에 원융자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허물이 없다’고 합니다.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음이라
無咎無法 不生不心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허물도 없고 법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있어서 원융무애한 줄 알면 큰 잘못입니다. 이 경지는 허물도 법도 없으며, 나지도 않고 마음이랄 것도 없습니다. 허물도 변邊이고, 법도 변邊이며, 나는 것도 변邊이며, 마음이라 해도 변邊입니다. 이 모두가 없으면 중도가 안 되려야 안 될 수 없습니다.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잠겨서
能隨境滅 境逐能沈
능能은 주관을, 경境은 객관을 말합니다. 주관은 객관을 따라 없어져 버리고 객관은 주관을 좇아 흔적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니,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것이 남아 있으면 모두가 병통이라는 말입니다.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니
境由能境 能由境能
객관은 주관 때문에, 주관은 객관 때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관이 없으면 객관이 성립하지 못하고, 객관이 없으면 주관이 성립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두가 병이므로 주관·객관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양단을 알고자 할진댄 원래 하나의 공이니라.
欲知兩段 元是一空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두 가지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원래 전체가 한가지로 공空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관도 객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근본 대도인데, 주관·객관을 따라간다면 모두가 생멸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두를 버려야만 대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양단兩段이 모두 병이고 허물이므로 이것을 바로 알면 전체가 다 공하다는 것입니다.
‘공하다’는 것은 양변을 여읜 동시에 진여가 현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공하다고 한 그 하나의 공은 말뚝처럼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함께 다 포함하여
一空同兩 齊含萬象
앞에서 ‘공하다’고 하여, 아주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알아서는 크게 어긋나니, 이는 단멸의 공[斷空]에 빠져 버립니다. 하나의 공이 양단과 같아서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의 공이란 차遮로서 부정을 말하고, 양단과 같다는 것은 조照로서 긍정을 말합니다. ‘양단을 버리면 하나의 공이 된다’는 것은 양단을 부정하는[雙遮] 동시에 양단을 긍정한다[雙照]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을 버리고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바로 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공이 둘과 동일하게 원융무애하므로 완전히 쌍차쌍조雙遮雙照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삼라만상이 하나의 공 가운데 건립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변견을 떠나 자성을 깨치고 중도를 성취하면 쌍차쌍조雙遮雙照의 차조동시遮照同時가 되어 삼라만상과 항사묘용이 여기에 원만구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空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체가 원만구족한 것을 공이라 하며 공이 또 공이 아니어서[不空], 일체 삼라만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不見精麤 寧有偏黨
앞 구절에서 ‘하나의 공’이란 공공적적空空寂寂하여 일체의 명상名相이 떨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공이 양단과 같으므로 일체 삼라만상 그대로가 중도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까지도 중도 아님이 없으므로, 사사무애事事無碍한 법계연기法界緣起의 차별이 벌어지게 되어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별이 벌어진다고 하니 어떤 실제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차별이 벌어져 드러났다 하여도 거기에 세밀함과 거칠음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이 곧 공이 아니며 공 아님이 곧 공이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여전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산이라느니 물이라는 생각과 산은 높고 물은 푸르다는 등 이러한 견해가 있으면, ‘하나의 공이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는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쌍차쌍조雙遮雙照하여 차조동시遮照同時한 무장애법계에 있어서는 세밀함과 거칠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벽된 것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모든 상이 다 떨어져 원융무애하고 대자재한 것을 말한 것이지, 세밀함과 거칠음이나 편당偏黨을 가지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세밀함과 거칠음에 기우는 편당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나의 공이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는 도리는 절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대도는 본체가 넓어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거늘
大道體寬 無易無難
무상대도는 그 본바탕이 넓기로는 진시방무진허공盡十方無盡虛空을 여러 억천만 개를 합쳐 놓아도 그 속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이 같은 무변허공無邊虛空이라 해도 실제로는 이 자성에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도의 본체는 바탕이 넓다’고 한 것으로서 무궁무진하고 무한무변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대도의 본체는 넓어서 어려움도 없고 쉬움도 없다’ 한 것은 본래 스스로 원만히 구족되어 있으므로 조금도 어렵다거나 쉽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스스로 원만히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공부해서 성취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도를 성취하려면 참으로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쉬운 것도 역시 아니라는 말입니다. 곧 쉽다, 어렵다 하는 것은 모두 중생이 변견으로 하는 말일 뿐입니다. 이는 본래 스스로 원만히 갖추어져 있는 대도를 모르고 하는 말이므로 이러한 쓸데없는 지견知見은 모두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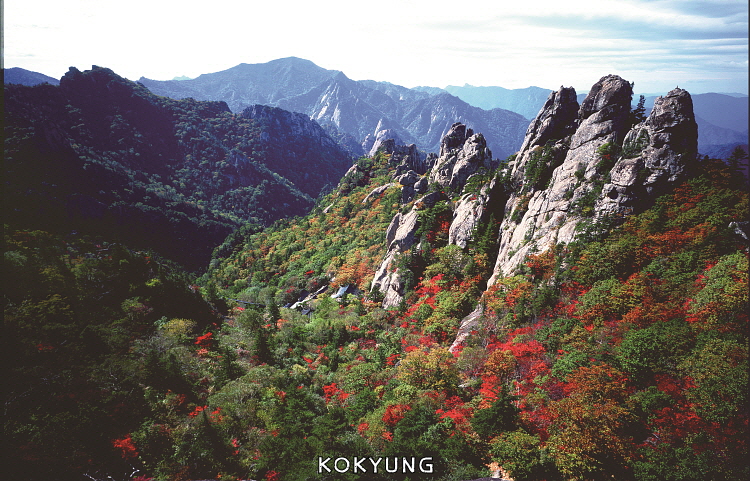
좁은 견해로 여우같은 의심을 내어 서두를수록 더욱 더디어지도다.
小見狐疑 轉急轉遲
조그마한 견해로 여우처럼 자꾸 의심하며 급하게 서두르면 반대로 더욱 더디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대도는 본래 스스로 원만히 갖추어져 있는데, 이를 자꾸 가깝게 하려 하면 더욱 멀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누구든지 대도를 성취하려면 쉽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어렵다는 생각도 내지 말며, 급한 생각도 더디다는 생각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쉽다·어렵다·급하다·더디다 하는 등이 모두가 변견으로서 취사심取捨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사심을 버려야만 대도를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착하면 법도를 잃음이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執之失度 必入邪路
대도나 중도나 또는 다른 뭐라고 하든지, 이를 집착하면 병이 됩니다. 누구든지 중도를 성취하고 부처를 이루려면 집착하는 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는 사람은 대도를 성취한 사람이며, 집착이 있는 사람은 대도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집착하는 병이 있으면 법도를 잃고 근본 대도와는 어긋나서 반드시 삿된 길, 즉 변견에 떨어지게 됩니다.
놓아 버리면 자연히 본래로 되어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도다.
放之自然 體無去住
홀연히 집착을 놓아 버리면 모두가 자연히 현전하며, 본체는 본래 가는 것도 머무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머무름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으면 머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는 본래 원만구족하여 머무름과 가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착하는 생각만 완전히 놓아 버리면 자연히 대도를 성취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견인 취사심을 버려야만 대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성철스님의 『신심명 증도가 강설』(장경각, 2001)에서 발췌.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옛거울古鏡’, 본래면목 그대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불면석佛面石 옆 단풍나무 잎새도 어느새 불그스레 물이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포행을 마치고 들어오니 책상 위에 2024년 10월호 『고경』(통권 …
원택스님 /
-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다네
어렸을 때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시절에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무덤 옆으로 지나갈 때는 대낮이라도 무서웠습니다. 산속에 있는 무덤 옆으로야 좀체 지나…
서종택 /
-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없다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二由一有 一亦莫守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변견은 하나 때문에 나며 둘은 하나를 전…
성철스님 /
-

구루 린뽀체를 따라서 삼예사원으로
공땅라모를 넘어 설역고원雪域高原 강짼으로 현재 네팔과 티베트 땅을 가르는 고개 중에 ‘공땅라모(Gongtang Lamo, 孔唐拉姆)’라는 아주 높은 고개가 있다. ‘공땅’은 지명이니 ‘공땅…
김규현 /
-

법등을 활용하여 자등을 밝힌다
1. 『대승기신론』의 네 가지 믿음 [질문]스님, 제가 얼마 전 어느 스님의 법문을 녹취한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여쭙니다. 그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중에 일심一心, 이문二…
일행스님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