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와 책의 향기]
홍사성 시인의 시
페이지 정보
조병활 / 2021 년 4 월 [통권 제96호] / / 작성일21-04-05 10:52 / 조회7,062회 / 댓글0건본문
“한 마디 이치에 맞는 말, 만겁 동안 나귀 묶는 말뚝[一句合頭語, 萬劫繫驢橛].”(주1) 이치에 맞는 말, 즉 합두어合頭語는 사람을 미망迷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 반대로 평생 동안 얽어매기도 한다. ‘이치에 맞게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치에만 너무 매여 창조성과 주체성이 쪼그라들면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다. 이치에 어긋나지 않되 자유로워야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어떻게 하면 될까? 대략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동자의 손가락을 자른 당나라(618-907) 선승禪僧 금화구지金華俱胝 선사의 방식이다. 『오등회원』 권제4 「금화구지金華俱胝 화상和尙」조에 있는 이야기다. 구지를 모시던 동자가 구지 화상을 흉내 내 엄지손가락을 자주 들곤 했다. 이를 본 구지가 동자에게 물었다. “불법佛法을 아느냐?” “압니다.” “무엇이 불법이냐?” 동자가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구지가 칼로 잘라 버렸다. 동자가 울면서 달아나자 구지가 불렀다. “무엇이 깨달음이냐?” 동자가 무심결에 손가락을 세웠지만 손가락이 없었다. 그 때 동자가 몰록 깨쳤다. 손가락을 잘라 진리를 깨닫도록 했다[절지오도切指悟道]. 폭력적이나 효과는 확실하다.
다른 하나는 육긍 대부를 놀라게 한 남전보원(南泉普願, 748-834)의 방법이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제10 「육긍陸亘 대부大夫」조에 있는 문답이다. 육긍이 남전에게 물었다. “병甁 속에 한 마리 거위가 있습니다. 거위가 자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위를 죽여서도 안 되고, 병을 부셔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나오게 합니까?” 남전이 갑자기 “대부!”하고 고함질렀다. 육긍이 놀라 “예!”하고 엉겁결에 대답했다. “나왔네.”하고 남전이 말했다. 육긍은 이후 무엇에도 걸리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 병에서 나오게 했다[환명출병喚名出甁]. 고함쳐도 거칠지는 않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통과해도 다시 세 관문을 돌파해야 된다. ‘절지오도’나 ‘환명출병’조차 초월하기 위해서다. 무엇이 세 관문인가? 동정일여動靜一如의 초관初關, 몽중일여夢中一如의 중관重關, 숙면일여熟眠一如의 뇌관牢關이 그것이다. 세 관문을 뚫은 삶은 이치에 맞고 자유롭다. 초관에서 ‘범부’는 ‘성인’으로 변한다. ‘종범입성從凡入聖’이다. 중관에서 ‘성인’이 ‘범부’로 돌아간다. ‘종성입범從聖入凡’이다. 중관의 범부는 초관의 범부가 아니다. 뇌관은 범부와 성인에 구애되지 않고 벗어난 경계다. ‘범성구불립凡聖俱不立’이다. ‘범부가 변한 성인[초관]’이나 ‘성인을 겪은 범부[중관]’는 여전히 범부와 성인에 묶여 있다. 미망[迷]과 깨침[悟]의 경계인 뇌관을 넘어야 비로소 둘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도리道理를 거스르지 않되 자유롭고, 자유롭되 이치를 망각하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指月]’도 달을 보고 ‘언어로 달을 설명해[話月]’도 달을 찾아낸다.(주2)
문자로 달을 설명한 것이 시詩다. 문자로 된 시는 ‘글자를 초월한 의미를 전달[敎外別傳]’하며, 말을 빌려 ‘말 밖의 소리[言外之音]’를 깨닫도록 유도한다. ‘궁극의 진리[第一義]’는 언어문자에 구애되지 않지만 언어로 설명하고 전달해야 된다. ‘하늘의 달[勝義諦]’은 물을 가리지 않으나 사람들은 ‘흐린 물[顚倒語]’에 뜬 달을 보지 못하고 ‘맑은 물[格外語]’에 비친 달만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현상에 내재된 진리를 문자로 담아내는 시는 이런 점에서 얼마나 귀중한가!
물론 신기한 구절과 기괴한 표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달을 보지 못한다. 『소식문집蘇軾文集』 권72 「승자기僧自欺」에 “(일부) 출가자들은 술을 ‘반야탕’이라 말하고, 고기를 ‘수사화(水梭花, 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꽃)’라 하고, 닭을 ‘찬리채(鑽籬菜, 울타리 뚫는 나물)’라 부른다. 결국 아무런 이로움 없이 다만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주3)고 나온다. ‘반야탕’, ‘수사화’, ‘찬리채’ 등은 과도하게 언어를 꼬았기에 나타난 말들이다. 이런 단어들에 집착하면 결코 ‘달’을 깨달을 수 없다. “물고기는 이미 세 단계나 되는 용문龍門의 높은 파도를 뛰어넘어 용으로 변했는데, 물고기 잡으려 깊은 밤에 연못의 물을 퍼내는 어리석은 사람”(주4)이 되고 만다. 말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퍼내는 ‘연못의 물’이 이런 단어들이다.

『불교평론』 홍사성 주간(시인, 사진 1)(주5)이 펴낸 『내년에 사는 법』(서울: 책 만드는 집, 2011), 『고마운 아침』(서울: 책 만드는 집, 2018), 『터널을 지나며』(서울: 책 만드는 집, 2020) 등은 독자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용’으로 변화시켜줄 시집詩集으로 보인다. 심플한 시어詩語로 누구나 보고 듣는 일들을 재치 있게 풀어 그 속에 내재된 이치理致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전문적인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대개는 평이平易한 말들이 시어로 쓰였다. 생활 속에서 겪었거나, 겪을 수 있는 경험을 소재로 삼아 소박한 단어로 지극한 이치, 즉 현리玄理를 나타냈다. 강제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한다. 작위적 단어들은 거의 없다. 읽다가 웃으면 삶의 이치가 이미 옆에 와 앉아 있다. 『내년에 사는 법』(사진 2)에 담긴 몇 편의 시를 보자.
잘난 척하던 저 친구
벌거벗겨 놓고 보니 별게 없다
허리둘레만 된장독 같지
힘은 제대로 못 쓸 것 같다
엉덩잇살은 축 늘어졌고
옆구리에는 큰 수술 자국이다
오늘처럼 꿀꿀한 날은
목욕탕에나 자주 와야겠다
- 「대중목욕탕」 전문 -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흔히 쓰는 단어들을 이리저리 묶어 잘 배열해 놓았다. 읽기만 해도 의미가 이해된다. 벗겨놓으면 나와 별 다른 게 없는, 아니 나 보다 못한 ‘그 친구’에게 주눅 들었던 화자話者는 목욕탕에 오면 원기를 회복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아마도 ‘친구의 지위·직급·겉모습·재산’ 등등에 눌려 살았을 화자는 목욕탕에서 나 보다 못한 “잘난 척하던 저 친구”의 ‘참모습[實相]’을 알고 내심 자위自慰한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자기나 나나 ‘똑같은 사람’임을, 아니 ‘저 친구가 나 보다 못한 사람’임을 확실히 인식한다. 얼핏 보면 소시민이 자존심을 회복하는 비결을 밝혀놓은 시詩같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구나
비 오는데 덮어주지도 않는구나
버려도 주워 갈 사람 없구나
문짝 떨어진 냉장고, 허연 속살 드러난 가죽 소파,
펑크 난 자전거 타이어, 찌그러진 냄비,
허리 부러진 숟가락, 때 묻은 곰 인형……
저렇게 버려질 것을 차지하려고
그토록 아옹다옹했다니,
어느 날 숨 끊어지면
이 몸뚱이마저 쓰레기라는 걸 몰랐다니,
- 「쓰레기장」 전문 -
사랑하던 것들 다 뿌리치고
미워하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어느 바람 부는 날 혼자 가서
미리 누워 있는 네 모습
- 「저 무덤」 전문 -
쓰레기장에 버려진 물건들을 보고 그것들에 아옹다옹 집착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한다. 누구나 보는 쓰레기장이다. 모두가 아는 평범한 말들을 조합해 지어진 시다. 결국 버려질 물건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이 시는 잘 보여준다. “몸뚱이마저 쓰레기”라는 표현은 충격적이다. ‘지나친 집착’이 곧 ‘고苦’라는 ‘그 의미’는 「저 무덤」에서 더욱 심화深化·승화昇化된다. ‘삶’도 결국은 “어느 바람 부는 날 혼자 가서 누워 있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불광동 언덕배기 한림교회 앞마당 열다섯 살짜리 자목련
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꽃보다 더 꽃이었을 옆집 할머니 나무
밑에 옮겨 앉아 넋 놓고 꽃구경한다 예술대학 사진과 다니는
손녀가 작품이라며 찰칵찰칵 셔터를 눌러댄다
- 「봄날」 전문 -
‘인생의 봄날’을 넘긴 할머니가 꽃을 본다. 그것도 열다섯 살짜리 자목련 꽃이다. 예술대학 사진과 다니는 손녀가 그 모습을 사진에 담는다. 봄날은 ‘할머니’에서 ‘자목련’으로, 그리곤 ‘손녀’를 거쳐 마지막엔 ‘작품 사진’에 담긴다. 봄날이 지나간 할머니가 본 ‘그 봄날’은 간단한 시어詩語 몇 개로 손녀에게 이어지고 사진에 남는다. 물론 ‘그들의 봄날’은 의미가 서로 다르리라. 할머니가 지금 보는 봄날이 ‘회상回想’이라면, 자목련이 지금 피운 봄날은 ‘극성極盛’이며, 손녀가 지금 사진에 담은 봄날은 ‘작품作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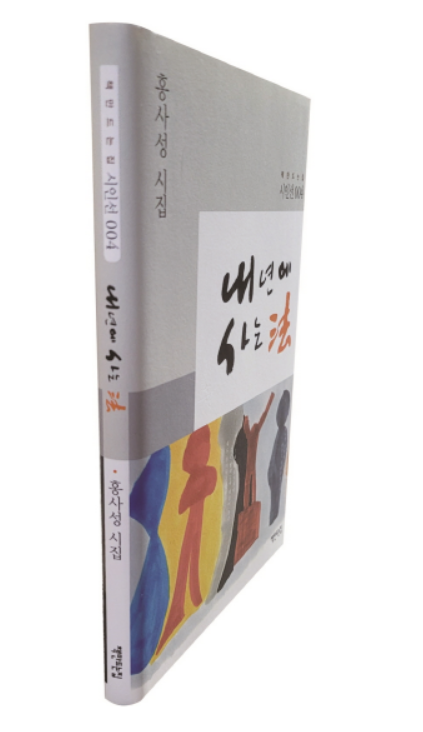
「대중목욕탕」, 「쓰레기장」, 「저 무덤」, 「봄날」 등에 담긴 의미는 이처럼 간단하다. 그러나 꼼꼼히 읽으면 읽을수록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 ‘그 무엇’이 다가온다. 특히 불교적 견지에서 보면 의미는 많이 달라진다. 중생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比較하고 자自·타他를 분별分別하는 존재임을 「대중목욕탕」은 깨닫게 하고, ‘몸뚱이’마저 결국엔 다른 쓰레기들처럼 “혼자 가서” 사라지는 ‘연기적 존재’임을 「쓰레기장」과 「저 무덤」은 알게 해주며, 할머니라는 존재가 직·간접적인 원인[因]이 되어 꽃과 손녀가 태어난다는 것을 「봄날」은 보여준다. 할머니는 꽃에게 꽃이 피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능작인能作因이 되고, 할머니는 손녀에게 손녀가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구유인俱有因이자 같은 사람이 되도록 끌어주는 동류인同類因이 되며, 할머니·자목련·손녀는 봄날에게 협력하는 상응인相應因이 된다. 시에 포착된 ‘한 순간의 그 봄날’은 할머니·자목련·손녀가 없으면 이뤄지지 않는다고 불교인식론은 파악한다.
『고마운 아침』(사진 3)에도 ‘수수한 단어’들로 배합된 시들이 많다. 읽을수록 의미가 새록새록 깊어진다. 언뜻 보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지나 곰곰이 읽으면 시어詩語의 이면에 스며있는 아픔에 가슴이 아련히 저려온다. 모든 삶의 현실은 결국 ‘고苦’임을 절감케 한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소아과에서 자라고
내과 외과 섭렵한 뒤
신경과 정신과 거쳐
마지막 모시는 곳은 옆 건물 지하 장례식장
- 「원스톱 서비스」 전문 -
요즘 들어 부쩍
새 친구가 늘고 있다
고혈압
전립선염
어지럼증
근육통
뒤늦게 만나 사이니
잘해보자며 눈까지 찡긋!
- 「새 친구」 전문 -
죽어라
살아봐야
반드시 가는 곳
예수도
부처님도
피하지 못한 곳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라서 하라는 곳
- 「그곳」 전문 -
발목이 푹푹 빠져 걸을 수가 없었다
올라가려 할수록 자꾸만 미끄러졌다
지금껏 걸어온 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 「쿠무타거 모래언덕」 전문 -
구름 흘러가는 대로
강물 흘러가는 대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떠나가네
바람에
빈 몸 맡기고 굴러가는
나는 낙엽
한 잎
- 「운수납자」 전문 -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병들다니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죽는다니
내 갈 길 또한 저렇다니, 피할 수 없다니
- 「예정설」 전문 -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시들이다. 맑은 물처럼 명징明澄하고 담백淡白한 의미의 이면에 배인 고뇌苦惱가 오히려 독자들을 슬며시 슬프게 한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죽어라 살아봐야” 다가오는 새 친구들이라는 게 “고혈압, 전립선염, 어지럼증, 근육통” 등이며, 그래서 결국엔 “예수도 부처님도 피하지 못한” ‘그곳’에 가야만 한다. 다만 “구름 흘러가는 대로/ 강물 흘러가는 대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떠나”간다. “내 갈 길 또한 …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生·주住·이異·멸滅,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 병고病苦, 도반道伴 등과 같은 논리적·개념적인 말들을 쓰지 않고도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의 생존방식을 훌륭하게 묘사했다. 그럼에도 시인은 “올라가려 할수록 자꾸만 미끄러지는” 그 길을 “몸부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목숨”(시 「목숨」의 마지막 부분)이라며 ‘새 친구’ 따라 그냥 가지만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강조한다.
세 번째 시집 『터널을 지나며』(사진 4)는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와 지혜를 돋보이게 하는 ‘방편’이 잘 조화된 시집이라 할만하다. 구김살 없는 시어詩語들이 맑은 수채화 같은 산뜻한 삶을 그려내고 있다. 방편 없는 지혜는 날카롭지만 무미건조하고, 지혜 없는 방편은 삿되기 쉽다. 『유마힐소설경』이 “방편 없는 지혜는 속박이며 방편 있는 지혜는 해탈이다. 지혜 없는 방편은 속박이며 지혜 있는 방편은 해탈”(주6)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혜와 방편이 적절하게 조화된 삶은 어떤 것일까? 시詩의 화자가 밝혀놓은 삶을 따라가면 알 수 있다. 화자話者의 일생은 「코스모스」와 「나의 여자관계」에서 시작된다.
우리 반 담임선생님은
허리가 가늘고 목이 길었습니다
원피스를 즐겨 입었는데
웃을 때는 하얀 이가 참 이뻤습니다.
양산을 쓰고 둑길을 걸어가면
연한 분 내음이 났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며 나는
죄 없는 돌멩이를 걷어차곤 했습니다.
- 「코스모스」 전문 -
“죄 없는 돌멩이를 걷어차던” 그의 행동은 ‘어릴 적부터 복잡한 여자관계’가 원인(?)일 수도 있다. “고백컨대 나는 여자관계가 좀 복잡하다// 할머니에게는 손자 외할머니에게는 외손자 어머니에게는 아들 백모 숙모 고모 이모에게는 조카 …… // 나를 여자 없이 못 사는 사내라는데 사실이다/ 나는 이날 입때껏 뭇 여자의 치마폭에서 살았다 … // 알아봤더니 우리 집안 내력이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 사촌들도 그렇다고 한다”(「나의 여자관계」) 그래서 “죄 없는 돌멩이를 걷어차며” 여자 선생님을 뒤따라 걷는 소년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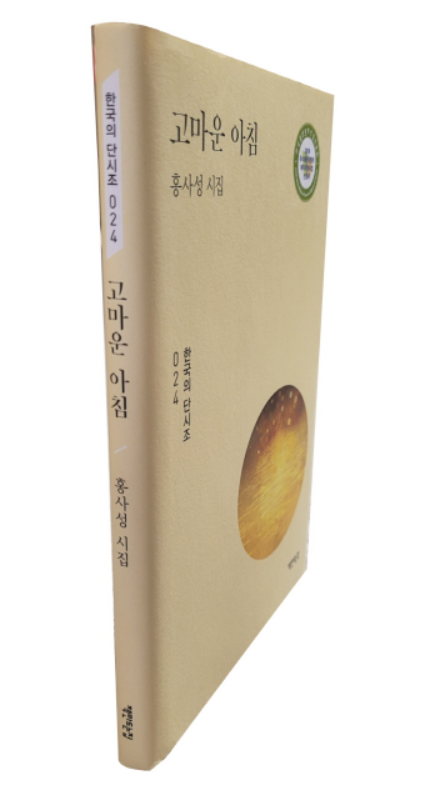
그러다 점차 “살아서는/ 논매고 밭 갈고/ 등짐 나르고 달구지 끌고/ 자식도 몇 남 몇 녀씩 낳아 기르고// … // 부처와 예수도 걷지 않은 길/ 마른 눈물 참으며/ 혼자 걸어간 소보다 더 소 같았던// 눈 뜨고 보면 절망/ 눈 감고 생각하면 또 그리운/ 아버지”(「성자의 길」)의 인생을 이해하며, 본인도 성장했다. 결혼 뒤 때때로 아내의 감시도 받았다. “한때 아내의 의심을 받은 적 있다 술 한 잔 마시고 늦게 들어간 날은 양주였는지 막걸리였는지 냄새 맡고 와이셔츠 벗어놓으면 지문 감식 하듯 살필 때도 있었다 여자에게 전화 오면 바늘로 찌르듯 꼬치꼬치 캐묻고 넥타이라도 선물 받은 날은 아귀 맞는 설명 못 하면 잠을 잘 수 없었다”(「그리운 질투」) 그러나 나이 들자 아내는 “변해도 너무 변했다 … 애들도 떠났는데 늦둥이하나 만들어 오랴, 간 큰 농담을 해도 주제 파악이나 하라며 비웃고 병들어 골골거리지 말아야 나중까지 살아주겠다”(「그리운 질투」)며 화자話者에게 엄포까지 놓는다. 알고 보니 아내에게 애인이 있었다.
처음에는 장동건이었다
그러다가 배용준을 좋아하더니
다음에는 이병헌 그다음은 장혁이라 했다
한때는 장사익만 듣다가
언제부터는 민우혁으로 바꾸더니
요즘은 낮이나 밤이나 임영웅만 찾는다
그사이 옛날 남자는
애인 자리에서 밀려나
이제는 찬밥을 넘어 쉰밥 신세
사랑은 날마다 변하고 달마다 변하는 것
모든 사랑은 추억으로만 남는 것
그 말, 씹을수록 쓰다
- 「아내의 애인」 전문 -
‘수많은 애인 때문에 남편에게 엄포 놓던’ 그 아내가 한 번은 동창회에 갔다가 일찍 돌아왔다. “누구는 반지가 크고 누구는 명품 가방을 들었고 누구는 은여우 목도리 둘렀고 누구는 주름살 펴 처녀 같아졌는데 자기만 으쓱할 게 없었다// 기죽지 않으려고 잘난 척하는 것들에게 한마디 했다고 했다// 개밥들아 잘 놀아라 도토리는 들어간다”(「개밥과 도토리」) 애인이 자주 바뀌던 화자의 아내는 친구들 사이에서 도토리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개밥들을 버리고’ 집에 일찍 들어 온 것이다.
이렇게 아내와 사랑을 밀고 당기는 사이 텔레비전 등 가구들은 하나 둘씩 삭아지고 있었다. “십몇 년을 같이 지내던 텔레비전을 명퇴시켰다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 깨어나 세상만사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떠들던 식구나 다름없던 친구였다// … // 그런 그도 세월을 어쩌지 못하겠는가 자구 찍찍거리더니 가끔 기절까지 했다 의사를 불러 치료해 주었지만 늙고 병든 몸이라 백약이 무효였다// 할 수 없이 이별을 결심했다 애써봐야 돌이킬 수 없다면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었다 새 텔레비전이 들어오자 옛 친구는 금방 잊혀졌다”(「안녕, 늙은 텔레비전」) 집안의 가구는 차츰 바뀌었다. 누구나 겪는 이런 저런 다양한 인생의 굴곡[터널]을 거치며 화자는 세상의 이치를 점점 깊이 체회體會한다. 통과한 ‘터널’의 숫자도 많아졌다.
터널은 어둠의 길이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
수도 없이 거푸 입 벌리고 있는
터널 속에서는 속도 제어가 안 된다
자동차들은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꼬리에 불붙은 노루처럼 기를 쓰고 달린다
터널 뚫던 사내들이 그랬을 것이다
하나를 뚫으면 다시 맞대면해야 하는
막장, 그 막막한 어둠은
절망과 한숨의 은산철벽
그럴수록 어금니 악물어야 했다
땀 묻은 곡괭이질로 곰 굴 파듯 악착같이
파나가야 했다 다른 수가 없었다
그 끝, 손바닥만 한 한 하늘에서 쏟아지는
황금화살에 꽂힌 금빛 고슴도치가 되는
고통의 순간만이 위로였다
오늘도 늑대처럼 쫓아오다 사라지는
공룡 배 속 같은 긴 어둠의 길
백미러로 힐끔 돌아보며
사내들은 다시 액셀러레이터를 밟는다
터널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 「터널을 지나며」 전문 -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터널을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적지 않게 뚫었다. “절망과 한숨의 은산철벽”을 뚫는 사이 화자는 인생의 고통에 익숙해졌고, 액셀러레이터 밟는 기술까지 적지 않게 익혔다. 앞으로도 뚫어야 할 터널은 있을 것이다. ‘인생의 여러 터널’들을 지나오던 화자는 그 사이 마침내 김천 직지사 주지 스님이 황학루를 비뚜름하게 지은 이유까지 파악한다. “하필 누각 지을 자리에 못생긴 개살구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살리려고 그랬다 합니다. 개살구나무를 베어내자는 사람 여럿이었으나 주지 스님이 고집을 부려 할 수 없이 비뚜름하게 지었다 합니다”(「불사佛事」) 삶의 터널을 지나온 모든 존재는 -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혹은 작은 존재든 큰 존재든 – 나름의 의미와 의의가 있음을 화자는 비로소 확철대오廓徹大悟한다.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땀 묻은 곡괭이질로 곰 굴 파듯 악착같이 팠기에” ‘지혜’를 증득證得할 수 있었고, “오늘도 늑대처럼 쫓아오다 사라지는 공룡 배 속 같은 긴 어둠을 백미러로 힐끔 돌아보며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방편’마저 터득했다. 지혜와 방편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개살구나무를 살린 불사佛事의 크나큰 의미까지 체득했다. 그러자 “어둠의 길”인 ‘터널’엔 광명이 가득 찼고, 항상 존재했지만 보지 못했던 ‘참다운 진리[法身]’가 바로 옆에 다가와 있었다. ‘진신사리’가 무엇인지도 몰록 깨닫는다.
평생 쪽방에서 살았던 중국집 배달원이
교통사로로 사망했습니다
고아였던 그는 도와주던 고아들 명단과
장기기증 서약서를 남겼습니다
- 「진신사리」 전문 -
화자는 바로 옆(주변)에서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발견한다. 남송의 나대경(羅大經, 13세기 초·중엽)이 편찬한 『학림옥로鶴林玉露』에 전하는 어느 비구니 스님의 오도시悟道詩처럼: “하루 종일 봄을 찾았으나 보지 못하고, 짚신 신고 밭두둑의 구름만 부지런히 밟았네. 돌아와 웃으며 향기 가득한 매화나무 가지 잡고 냄새 맡으니, 가지 끝에 봄이 이미 가득하네.”(주7) 매일 보던 정원의 매화나무 가지에서 ‘봄’을 찾았듯이 화자는 길에서 간혹 보았던 중국집 배달원이 남긴 ‘고아들 명단’과 ‘장기기증 서약서’가 ‘진신사리’임을 깨닫는다. 중국집 배달원에겐 음식을 제대로 열심히 나르는 것이 수행이었고, 수행의 공덕(급료)을 회향한 결과 출현한 ‘진신사리’가 ‘명단’과 ‘서약서’였다. 중국집 배달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며, 배달원이 남긴 ‘고아들 명단’과 ‘장기기증 서약서’ 역시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다. 그래서 ‘진귀한 신체에서 나온 사리(유골)’다. 「진신사리」가 가리키는 ‘달[月]’은 명백하다. ‘이치에 맞는 말[合頭語]’은 참다운 행동(수행)이 될 수 없고 ‘진실한 문서(명단과 서약서)’는 ‘나귀 묶는 말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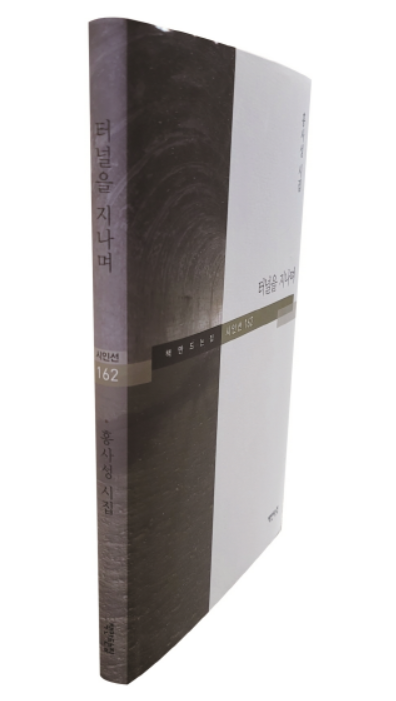
홍 시인은 『내년에 사는 법』, 『고마운 아침』, 『터널을 지나며』 등 3권의 시집에서 누구나 겪는 일 속에 내포되어 있으나 설명하기 쉽지 않은 이치를 소박한 말로 풀었다. 그렇다고 그저 ‘재미있고 우스운 시집’은 결코 아니다. 간명한 시 속에 지극한 이치를 담아 독자들이 스스로 달을 깨닫도록 했다. 따라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레 삼단의 높은 파도를 뛰어 넘어 ‘용’으로 변한다. 금나라(金, 1115-1234)를 대표하는 문인 원호문(元好問, 1190-1257)이 「호화상송서暠和尙頌序」에서 “시는 수행자에게 아름다운 비단을 덧붙이는 것이며, 선은 시인에게 옥을 자르는 칼이다.”(주8)고 지적했듯이 3권의 시집에 사용된 진솔하고 맛깔스런 언어는 시인에겐 아름다운 비단이고, 독자들에겐 어리석음을 잘라내는 칼이다. 아름다운 비단은 방편이고 칼은 지혜를 상징한다. 방편과 지혜가 잘 조화된 ‘시’는 ‘손가락’이 아니고 ‘달 그 자체’다.
주)_
1) 『오등회원五燈會元』 권제5 「수주화정선자덕성선사秀州華亭船子德誠禪師」조에 있다. 선자덕성 선사가 협산선회夾山善會 선사에게 한 말이다.
2) 현사사비(玄沙師備, 835-908)는 “나에게 정법안장이 있으니 대가섭에게 맡긴다.”는 붓다의 말을 ‘화월話月’로, 불자拂子를 치켜든 혜능의 태도를 ‘지월指月’로 표현했다. 말과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는 의미다. 『오등회원』 권제7 「복주현사사비종일선사福州玄沙師備宗一禪師」조에 나온다. “吾有正法眼藏, 付囑大迦葉, 我道猶如話月. 曹溪竪拂子, 還如指月.”
3) “僧謂酒‘般若湯’, 謂魚‘水梭花’, 謂鷄‘鑽籬菜’, 竟無所益, 但自欺而已.” 소동파蘇東坡는 1037년에 태어나 1101년에 타계했다. 북송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문장가다.
4) “三級浪高魚化龍, 癡人猶戽夜塘水.” 『벽암록碧巖錄』 제7칙의 송頌.
5) 강원도 강릉 출생. 2007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
6) 『維摩詰所說經』(T14, 545b), “無方便慧縛, 有方便慧解; 無慧方便縛, 有慧方便解.”
7) “盡日尋春不見春, 芒鞋踏破壟頭雲. 歸來笑捻梅花嗅, 春在枝頭已十分.” 『鶴林玉露』, 北京: 中華書局, 1983, p.346.
8) “詩爲禪客添花錦, 禪是詩家切玉刀.” 『元好問全集』(增訂本, 上),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2004, p.782.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옛거울古鏡’, 본래면목 그대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불면석佛面石 옆 단풍나무 잎새도 어느새 불그스레 물이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포행을 마치고 들어오니 책상 위에 2024년 10월호 『고경』(통권 …
원택스님 /
-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다네
어렸을 때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시절에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무덤 옆으로 지나갈 때는 대낮이라도 무서웠습니다. 산속에 있는 무덤 옆으로야 좀체 지나…
서종택 /
-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없다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二由一有 一亦莫守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변견은 하나 때문에 나며 둘은 하나를 전…
성철스님 /
-

구루 린뽀체를 따라서 삼예사원으로
공땅라모를 넘어 설역고원雪域高原 강짼으로 현재 네팔과 티베트 땅을 가르는 고개 중에 ‘공땅라모(Gongtang Lamo, 孔唐拉姆)’라는 아주 높은 고개가 있다. ‘공땅’은 지명이니 ‘공땅…
김규현 /
-

법등을 활용하여 자등을 밝힌다
1. 『대승기신론』의 네 가지 믿음 [질문]스님, 제가 얼마 전 어느 스님의 법문을 녹취한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여쭙니다. 그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중에 일심一心, 이문二…
일행스님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