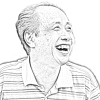[한국의 다도]
茶, 어떻게 읽어야 할까?
페이지 정보
오상룡 / 2021 년 11 월 [통권 제103호] / / 작성일21-11-03 13:49 / 조회7,493회 / 댓글0건본문
한국의 茶道 11 / ‘茶’, 차 혹은 다
‘차(cha)’는 광동성의 마카오 사투리에서 전파된 것이고, ‘테(te)’는 복건성의 아모이 사투리로부터 전파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한음漢音인 ‘다(ta)’, 오음吳音인 ‘사(sa)’, 관용음寬容音인 ‘차(cha)’가 함께 사용 되어 왔다. 현대에 와서 ‘茶’를 읽을 때, ‘차’ 혹은 ‘다’로 읽는다. 어떻게 읽는 것이 바람직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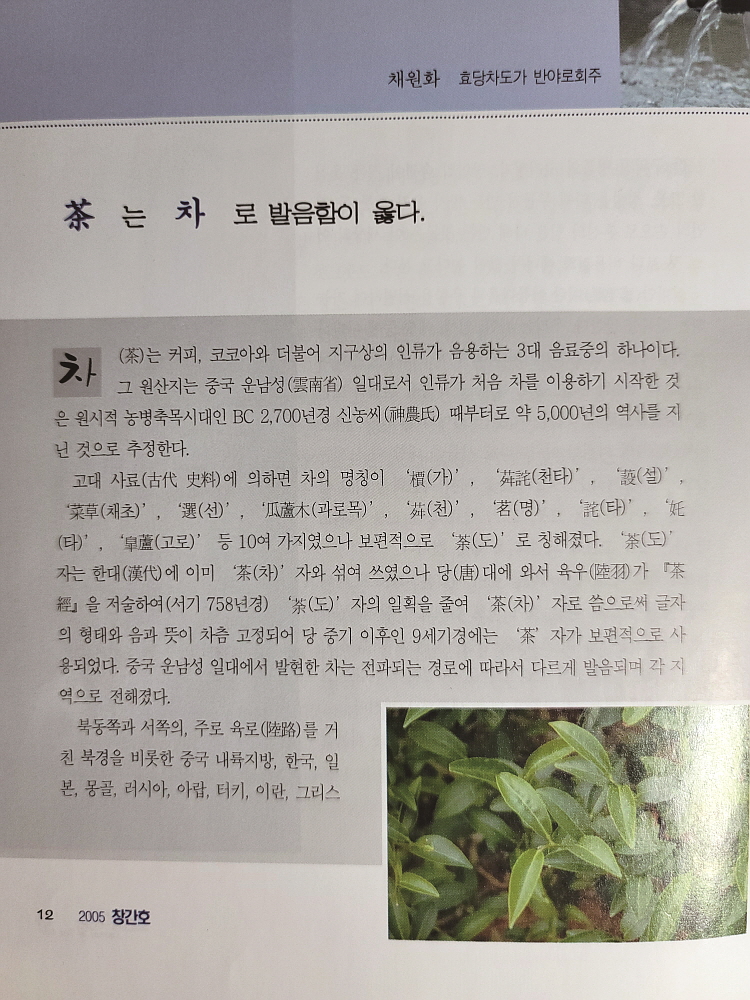
사진 1. 계간 『차생활』 창간호 채원화 논문.
‘茶’ 자는 ‘차’로 발음함이 옳다(주1)는 주장
채원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차’라고 발음되어 왔음을 다음의 몇 가지 사료적 근거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차는 운남성 일대에서 중국 본토를 거쳐 북동쪽으로 전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Cha’라고 발음되며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중국 청대淸代에 편찬된 대표적 자전인 『강희자전康熙字典』에 의하면 ‘茶’는 ‘眞加切진가절 鋤加切서가절 丈加反장가반 垞加反타가반 弋奢反익사반’으로 발음됨을 표기하고 있 으니 ‘짜’, ‘차’, ‘사’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차사茶事와 관련된 용어들이 우리나라 『동국정운東國正韻』, 『월인석보月印釋譜』 등 여러 언해본諺解本 소설류 등에서 ‘차’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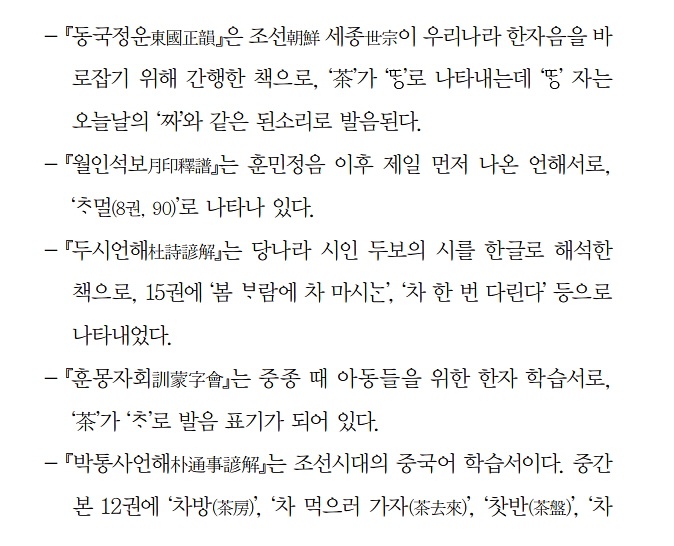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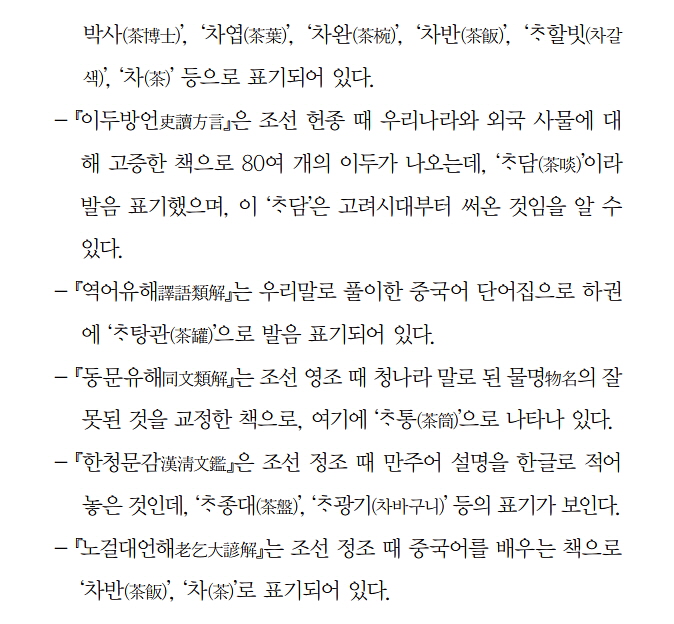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절이면 조상의 덕을 기리며 추모하는 제례를 ‘차례茶禮’라 하였다. 또한 옛 조세제도의 일종인 공물제도貢物制度, 즉 지방의 토산물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던 것으로 차가 나는 지역은 차를 특산물세로 거둬들였는데, 이때 차를 만들어 보관하던 독을 ‘찻독茶櫝’이라 지칭하였다. 차가 생산되는 곳에서는 거의 오늘날까지 ‘챗독(찻독)’이라 불리며 쌀독으로 대신 사용되어 온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으므로 ‘茶’와 관련된 일들을 ‘차’로 발음함이 타당하다.
사진 2. 차밭.
‘茶’ 자 용어의 독음讀音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주2)
이영숙은 여러 문헌을 통해 ‘茶’ 자의 우리말 음이 ‘차’와 ‘다’로 읽힌 것은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이후라 주장하면서, 특히 현대에 10개의 국어사전에서 ‘茶’ 용어의 독음을 비교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모두 ‘다’ 음音으로 나오는 경우일 때는 불가·제사·궁중에서 쓰는 용어와 음다 공간과 제다구製茶具와 동사로 된 낱말과 민속어와 고유어와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모두 ‘차’ 음音으로 나오는 경우일 때는 차제구茶諸具와 차 이름과 우리말인 향속어와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다’와 ‘차’가 혼용으로 나오는 경우는 차제구茶諸具와 차 이름, 그리고 기타로 나눌 수 있다.
사진 3. 차나무.
이영숙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다’와 ‘차’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다차원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 茶’는 고어古語이거나 한자漢字의 번역음으로 한자와 합성어일 때는 ‘다’로 적고 읽는다.
둘째, ‘차’가 단독으로 쓰일 때와 찻감이나 차 탕을 뜻할 때는 ‘차’로 읽고 쓴다.
셋째, ‘차’가 향속어와 합성어일 경우에 순우리말 ‘차’ 용어가 되었다.
넷째, ‘~하다’가 붙어 동사가 되는 동사적 용어는 ‘다’로 읽는다.
다섯째, ‘차’와 ‘다’가 혼용으로 쓰이는 경우, 일상적이고 쉬운 말과 복합된 용어는 ‘차’와 ‘다’로 쓴다.
차제구茶諸具는 ‘차’로 쓰이고 관습대로 ‘다’로도 쓰인다.
여섯째, 불교 용어와 궁중 용어는 ‘다’로 읽고 쓴다.
기타, 고유명사와 전문어인 민속어와 역사어와 식물 이름 등은 관례대로 쓴다.
‘茶’ 자 용어의 독음을 고찰한 결과 ‘茶’ 자 용어의 총체적 용례는 크게 세갈래로 나눌 수 있다. ‘茶’ 자는 한자의 독음讀音으로는 모두 ‘다’로 쓰였다. 그런데 일상적이거나 향속 언어와 관련이 있는 용어는 대개 ‘차’로 쓰였고, 관습대로 혼용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
석용운은 『한국다예』(주3)에서 조선조에서는 한문을 주로 사용하는 사대부는 ‘다’를 고집스럽게 사용해 왔고, 한글을 애용하는 서민사회에서는 ‘차’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쓰였던 것 같다고 하면서, ‘차’와 ‘다’가 모두 옳은 것이니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였다.
-. 순수한 우리말의 복합어일 때는 ‘차’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 한문자의 복합어일 때는 ‘다’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 ‘차’와 ‘다’를 함께 사용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 어법語法에는 어긋나지만 ‘차’라는 음으로 보편화된 말이 있다.
사진 4. 찻잎.
독음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고, 필자 역시 현대 우리나라에서 ‘茶’ 자의 발음 현황을 두루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주4)
첫째, 순수한 우리말의 복합어일 때는 ‘차’로 발음한다. 예로는 ‘차나 무’, ‘차 드십시오’, ‘차나물’, ‘차찌꺼기’, ‘찻잎’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한문자의 복합어일 때는 ‘다’로 발음한다. 다구茶具, 다각茶角, 다과점茶菓店, 다정茶亭, 다식茶食 등이 그 예이다.
셋째, ‘차’와 ‘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이다. 茶禮(차례, 다례), 茶鐘(차종, 다종), 茶盞(차잔, 다잔), 茶罐(차관, 다관), 茶飯(차반, 다반), 茶室(차실, 다실), 茶房(차방, 다방) 등이 있다.
넷째, ‘차’라는 음으로 보편화된 말로, 國産茶국산차, 代用茶대용차, 人蔘茶인삼차, 傳統茶전통차, 雀舌茶작설차 등이 있다.
필자의 첫 번째 차 스승이신 효당스님께서는 현대에 와서 사전류를 만들면서 한자를 한글로 표시하면서 중국 한자를 진서眞書로 한글을 언문諺文이라 하며, 한글을 홀대하는 양반들의 사대주의 풍토가 ‘茶’를 ‘차’가 아닌 ‘다’로 표기하여 고착시킨 것으로 보셨다. 따라서 우리 전통 차 문화의 우수성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차사茶事에 관련되는 ‘茶’는 ‘차’로 발음하기를 권장하셨다.

사진 5. 차꽃.
습관이 관습이 되고, 관습이 전통이 되고, 전통이 문화가 되는 데는 보통 100년이 지나면 바뀐다고 한다. 조선 500년 동안 배불숭유정책으로 차가 좋은 것을 알고 있는 양반들이 ‘차생활’을 서민들이 쓰지 않는 ‘다생활’로 바꾸면서 ‘다’의 사용이 굳어진 것인데, 이제는 500년 전 서민들이 즐겨 사용했던 ‘차생활’ 원래로 돌아가 아직도 ‘다’보다는 ‘차’로 남아 있는 우리말 ‘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효당스님은 말씀하셨다. 스님의 유지에 따라 ‘차’ 혹은 ‘다’로 발음하는 것은 ‘차’로 발음하고, 크게 어색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급적 ‘차’로 발음하기를 계속해서 캠페인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차’이든 ‘다’이든 ‘도道’로 향하는 데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따라서 이 연재를 시작하면서 독자에 따라 본인이 어색하지 않게 읽으시라는 뜻으로 본고의 제목을 ‘한국의 다도’라 하지 않고, ‘한국의 茶 道’라 하여 독자 제현께서 편하신 대로 읽게 하였다.
각주)
(주1) 채원화:「‘茶’ 자는 ‘차’로 발음함이 옳다」, 계간 『차생활』 창간호, pp.12-19(2005.10.28.).
(주2) 이영숙:「‘茶’ 자 용어의 독음讀音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8.10.).
(주3) 석용운:『한국다예』, pp. 53-58, 도서출판 초의(1988.2.).
(주4) 오상룡:『차도학』, pp 2-8, 국립 상주대학교 출판부(2005.9.).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히말라야를 넘나들었던 신라의 순례승들
2001년 케룽현에서 4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종까마을에서 국보급 가치가 있는 고대석각古代石刻이 발견되어 중국 고고학계를 흥분시켰던 일이 있었다. 바로 〈대당천축사출명〉이란 비문(주1)이다. 이 …
김규현 /
-

대화엄사의 약사여래 마하연
화엄華嚴은 ‘꽃 화華’와 ‘엄숙할 엄嚴’이 만나 이루어진 말로, 온 세상이 한 송이 거대한 꽃처럼 피어나는 진리의 장엄함을 뜻합니다. 직역하면 이러하지만 화엄이라는 말 속에는 존재의 우주적 깊이와 …
박성희 /
-

동안상찰 선사 『십현담』 강설 ⑦ 파환향곡破還鄕曲
성철스님의 미공개 법문 11 파환향곡破還鄕曲이라. 앞에서 환향곡還鄕曲이라 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판인데, 이번에는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부숴 버린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온다고 하니…
성철스님 /
-

금목서 피는 계절에 큰스님을 그리며
예로부터 윤달이 들어 있는 해는 일반 달보다 여유가 있어 우리 선조들은 그동안 미뤄 두었던 일들을 처리하거나 마음을 정리하는 데 적합한 해로 여겨 왔습니다. 평소에는 꺼렸던 일도 윤달은 ‘귀신도 쉬…
원택스님 /
-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光陰莫虛度]
중국선 이야기 56_ 법안종 ❸ 법안종을 세운 문익은 청원계를 계승한 나한계침羅漢桂琛의 “만약 불법을 논한다면, 일체가 드러나 있는 것[一切現成]이다.”라는 말로부터…
김진무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