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어록의 뒷골목]
오늘도 별이 바람에 시달린다
페이지 정보
장웅연 / 2016 년 5 월 [통권 제37호] / / 작성일20-05-29 12:47 / 조회6,162회 / 댓글0건본문
고독은 슬픔이기에 앞서 방벽(防壁)이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또한 혼자여야 편한 법이다. 『미움 받을 용기』류(類)의 베스트셀러들은 개인주의를 향한 소시민들의 갈망을 자극한다.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말라’ ‘타인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 등속의 격려는 아름답고 든든하다.
그러나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헬조선’임을 감안하면, 끝내 감언이설이다. 착하게만 살지 않겠다는 누군가의 결심에 왕따가 발생하고, 타인들의 평가에 의해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남들이 지닌 권력인 셈이다. 저자들은 직장생활을 안 해본 것 같다.

학창시절, 혈혈단신으로 ‘삥’을 뜯는 깡패는 보지 못했다. 몇몇이 패거리를 지어 순한 전체를 괴롭히는 게 보편적인 패턴이었다. 무리 가운데는 이른바 ‘짱’이라는 존재가 있게 마련인데, 돌이켜보면 그가 정말 싸움을 잘해서 ‘짱’을 먹은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가장 악랄한 놈이었던 것이다.
‘본래부처’를, 쉽게들 이야기한다. 물론 누구나 부처이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유능하거나 존귀하지는 않다. 폭력이 장악하게 마련인 현실이 그렇다. 그런 맥락에서 불력(佛力)이란 오직 개인으로서 버텨내는 데서 커지는 ‘상처적’ 역량 아닐는지. 본래부처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며 정진은 홀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란 가설을, 나는 아직도 포기할 수가 없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시달린다.
제48칙 유마경의 불이(摩經不二, 마경불이)
유마가 문수 보살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불이(不二)의 경지에 드는 것입니까?” 문수가 답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법에 대하여 말로 정의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남에게 보일 수도 없고 자기가 알 수도 없어서 모든 문답을 여읜 것이라 여깁니다.” 문수가 도리어 물었다. “우리들은 제각기 말을 다 했는데 당신은 불이의 경지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유마는 잠자코 있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진실을 나누면 진영이 된다. 두 개의 진실 사이에서 사람들은 싸우다가 때론 달래다가, 각자의 몫을 알아서 챙겨간다. 무턱대고 타박하긴 어렵다. 식구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가장(家長)은 사기꾼이다.
반면 사정이 이러하기에 유마의 깨달음은 더욱 눈부시다. 결혼하고 새끼 낳고 사교육 시켰을 재가자의 실존적 한계를 극복한 결실이니까. 사실 그가 지혜의 화신이라는 문수 보살을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진리는 말할 수 없다”니, 말하지 않은 것뿐이다. 밥 타령으론 배부를 수 없다.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 피하고 싶을 때, 요구하려 할 때, 변명하려 할 때, 이겨야할 때, 살아야할 때, 우리는 말을 한다.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일단 떠들어놓고 봐야 기회와 변수가 생긴다. 결국 한편으론 말하려는 순간의 마음은 일정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이다. 곧 말할 필요가 없는 삶이 가장 안정적인 삶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안타까워 보이겠지만,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유마는 침묵으로써, 임재(臨在)했다.
제49칙 동산이 진영에 공양하다(洞山供眞, 동산공진)
동산양개(洞山良价, 807~869)가 운암담성(雲巖曇晟, 782~841)의 진영(眞影)에 공양을 올리려는데 어떤 승려가 물었다. “운암이 이르기를 ‘다만 그것일 뿐이다(祗這是, 지저시)’ 하셨다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동산이 말했다. “하마터면 내가 스승의 말을 잘못 알아들을 뻔했다.” 승려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운암은 알고 게셨을까요?” 동산이 일렀다. “만일 알지 못했다면 어찌 그렇게 말할 줄을 알았으며, 만일 알지 못했다면 어찌 그렇게 말했겠는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가루가 되어도 물이 되지 못하며, 물은 얼음이 되어도 얼마 못 간다. 개는 개이고 새는 새다. 개가 개임을 괴로워하고 새가 개를 따라하려 하니, 세상은 개새들의 세상이 된다.
지저시. 삶이란 그저 그것일 뿐이다.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번번이 핑계와 구실을 찾는다. 찾는 만큼 흔들리고 찾은 만큼 혼곤하다. 동네 뒷산이라도 오르면 또는 세면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다보면,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결국은 최선이었음을 깨닫는다. 아쉽고 억울하고 때론 미안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50칙 설봉의 ‘웬일이니’(雪峰甚麽, 설봉심마)
설봉의존(雪峰義存, 822~908)이 암자에 살고 있는데, 두 명의 승려가 인사를 왔다. 설봉은 스님들을 발견하자 방문을 밀어제치고는 놀란 사람처럼 달려 나갔다. “웬일이냐!” 당황한 스님들이 “무슨 일 났느냐?”며 물었다. “아니다.” 설봉은 갑자기 풀이 죽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는 암자로 돌아가 버렸다. 두 승려는 그 길로 암두전활(巖頭全豁, 828~887)을 찾아갔다.
암두가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영남(嶺南)에서 왔습니다.” “그럼 설봉을 만났겠군.” “네.” “뭐라고 하던가?” 두 스님은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암두가 더 물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던가?” “그냥 가던데요.” 암두가 탄식했다. “아! 그걸 얘기했어야 했는데.”
시심마(是甚麽)는 ‘이뭐꼬’ 화두의 어원이다. 이뭐꼬는 ‘이것은 무엇인가’의 경상도 사투리. 무언가를 보고 있는 이놈은 무엇인가, 자꾸만 밥을 먹게 하는 이놈은 무엇인가, 앉기보다 눕는 걸 좋아하는 이놈은 무엇인가 등등. 시심마는 흔히 탐하고 노하는 자아에 억눌린 불성을 파악하기 위한 열쇠로 활용된다.
스스로 시작하는 인생은 없다.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내던져질 뿐이다. 태어남이 사고였듯, 돌아감도 어이가 없다. 순서도 없고 에누리도 없다. 이름과 신분이 무엇이었든, 다들 그저 그렇게 살다가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다들 별볼 일 없는 군상이다.
그러나 죽음은 멀다. 살아 있다면 살아 있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냘프지만 소중한 권리일 것이다. 설봉의 호들갑은 누가 알아주든 말든, 삶을 무언가 놀라운 것으로 만들어 가라는 당부가 아닐는지. ‘나’를 힘껏 발산하고 소진하는 과정에서, ‘나’는 구태여 찾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다.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어서는 곤란하다. 개돼지들도 행복을 꿈꾸며 산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부설거사 사부시 강설
성철스님의 미공개 법문 4 부설거사浮雪居士 사부시四浮詩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모두 다 잘 아는 것 아니야? 지금까지 만날 이론만, 밥 얘기만 해 놓았으니 곤란하다 …
성철스님 /
-

봄빛 담은 망경산사의 사찰음식
사막에 서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렵고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 생각 달리해서 보면 사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무한한 갈래 길에서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누군가가…
박성희 /
-

운문삼구, 한 개의 화살로 삼관을 모두 뚫다
중국선 이야기 49_ 운문종 ❹ 운문종을 창립한 문언은 이미 조사선에서 철저하게 논증된 당하즉시當下卽是와 본래현성本來現成의 입장에서 선사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김진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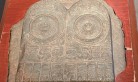
불립문자와 언하대오의 발원지 붓다
“도반들이여, 마치 목재와 덩굴과 진흙과 짚으로 허공을 덮어서 ‘집’이란 명칭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뼈와 신경과 살과 피부로 허공을 덮어서 ‘몸[色]’이라는 명칭이 생깁니다.”(주1) - 『…
박태원 /
-

불교전파와 바다 상인들의 힘
기원전 1500~기원전 1000년경 쓰인 힌두교와 브라만교의 경전 『리그베다(Rig-Veda)』는 숭앙하는 신을 비롯해 당시 사회상, 천지창조, 철학, 전쟁, 풍속, 의학 등을 두루 다룬다. 베다에…
주강현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