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추회요, 그 숲을 걷다]
자신을 돌이키는 것으로 으뜸을 삼는다
페이지 정보
박인석 / 2017 년 2 월 [통권 제46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4,365회 / 댓글0건본문
『명추회요』의 62권-3판(500쪽)에서 발췌된 내용의 제목은 ‘자신을 돌이키는 것으로 으뜸을 삼는다’이다. 이 단락의 전후에는 유식학(唯識學)의 내용이 많이 인용되는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유식학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한번 생각해볼만하다. 우선 ‘자신을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반기(反己)는 중국철학의 오랜 전통 속에서 나온 말이고, ‘오직 식만 있음’을 가리키는 유식(唯識)은 인도불교의 전통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전통에서 오랜 기간을 두고 정립된 이들 두 개념은 그 성격이 매우 이질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연수 선사가 보기에는 분명한 공통점을 갖는다. 그 점을 한번 살펴보자.
중국철학에 나타난 ‘자신을 돌이킴[反己]’
중국의 고전(古典) 가운데 하나인 『중용(中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공자가 말하였다. “활 쏘는 것은 군자와 비슷함이 있다. 과녁에서 빗나가면 [그 원인을] 돌이켜 자신에게서 구한다.”[子曰: 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둘째는 덕(德)을 지닌 사람이다. 후대로 갈수록 군자는 덕을 지닌 사람을 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덕(德)은 고대에서는 ‘얻을 득(得)’과 통용되었다. 이는 좋은 행동을 거듭 반복할 때 자신의 몸에 그 좋은 행동이 쌓여서 얻어지는 것을 말한다. 가령, 신의가 있고 정직한 언행을 거듭하는 사람은 그의 인격 역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감을 뜻한다.
공자는 이런 군자의 행위를 활 쏘는 것에 빗대어 얘기하고 있다. 먼저 활을 쏘는 사람이 있고, 저 멀리에 과녁이 있다. 사람과 과녁의 사이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 가령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 않거나, 눈이나 비가 내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한 뒤, 최종적으로 화살을 쏘아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도 그 결과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화살이 과녁을 빗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자는 화살이 과녁을 빗나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활 쏘는 사람과 과녁 사이의 다양한 외부적인 조건과 요인들을 탓하기에 앞서, 활을 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하는 자신의 내면의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외부적 변수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라는 말이다.
‘자신을 돌이킴’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항상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제기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늘 가정, 직장, 학교, 나라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사회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규모의 집단 혹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에 대해 공자는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의 현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고 그로부터 길을 찾으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고대시기로부터 전해 오다가 공자로 대표되는 유학(儒學)에서 정립된 철학적 방법론이다. 다만 이는 이론적인 분석보다는 실천적인 지점에서 사람에게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불교의 ‘식만 있고 경계는 없다[唯識無境]’
『명추회요』의 유식학 논의 가운데 근간이 되는 것은 『성유식론(成唯識論)』의 내용이다. 인도 유식학의 대성자인 세친(世親)은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이라는 짧은 게송을 남겼는데, 인도 불교의 10대 논사들이 이에 대해 상세한 해설을 붙였다.
이후 중국의 현장과 규기 법사가 이들을 한데 합쳐서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성유식론』이다. 이 책의 가장 중심 내용은 ‘식만 있고 경계는 없다[唯識無境]’는 문구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해서는 옛적부터 다양한 반박이 제기되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재 우리 눈앞에 다양한 사람과 사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다는 말이냐?’는 거부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반박들에 대처하기에 앞서 유식학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개념들의 함의를 정확히 기술하고자 노력한다. ‘식만 있고 경계는 없다’는 말에서 ‘식(識)’은 인간의 정신 활동 혹은 경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우리들의 생생한 경험을 절대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런 직접적인 지각과 경험이야말로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장(場)임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유식학자들이 비판하는 ‘경계[境]’란, ‘말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말의 대상’이 고스란히 이 세계에 실재한다는 견해를 집중 비판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은 매우 어렵게 들릴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가령 아라비아 숫자 ‘1’이라는 말에 대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실재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는 하나의 사과, 하나의 귤, 하나의 계란 등과 같이 무수한 ‘하나’가 있지만, ‘1’에 의해 지시되는 ‘하나’ 그것은 과연 실재하는 것인가? 또 다른 경우를 한가지 들어보자. 우리는 늘 ‘나의 연필’, ‘나의 휴대폰’, ‘나의 손가락’, ‘나의 마음’과 같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과연 ‘나’라는 말에 대응하는 ‘대상’의 정체는 무엇인가?
유식학자들은, ‘말’이란 어떤 것들을 추상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사고 능력과 다른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무수한 개별자들을 숫자 ‘1’로 추상화시키고, 다양한 행위가 귀결되는 주체로서 ‘나’를 상정한다. 이런 추상화의 능력은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더없이 큰 공헌을 하였지만, 유식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로 인해 사람들은 도리어 세계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의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늘 그것에 대응하는 실체가 우리의 정신과 독립해서 저 바깥에 존재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가정(假定)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혹은 집착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경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셨던 인도의 아트만(Atman)의 철학이 펼쳐진다. 이들은 인간의 무상한 육신 속에 불멸의 아트만이 내재해 있고, 더 나아가 이 아트만은 세계를 창조한 브라흐만(Brahman)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관점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의 기능과 작동원리 등을 근본적으로 반성해보지 않은 채, ‘나’라는 말에 대응하는 대상이 몸속에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비판하셨다.
유식학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러한 견해를 계승하여 ‘말에 대응하는 대상들로 구성된 세계’는 오히려 허구이고 추상적인 존재인 반면, 인간의 정신과 더불어 나타나는 세계[緣起]야말로 진정한 실재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도 불교의 유식학은 매우 정교한 인식론(認識論)과 언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자신을 돌이키는 것으로 으뜸을 삼는다
유식학이 인간의 ‘말’과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환영(幻影)의 정체를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면, 중국 철학의 ‘자신을 돌이킴[反己]’이라는 개념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최선의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는 매우 상이한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연수 선사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견해의 출발점은 모두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유식학은 이 세계의 다양한 모습이 결국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 투영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고, 중국 유학은 이 세계의 복잡한 현실을 헤쳐 갈 핵심 단서로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공통점을 『명추회요』 500쪽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직 불교만이 마음을 종지로 삼는 것은 아니다. 3교(三敎)의 귀결처에서 모두 ‘자신을 돌이키는 것으로써 으뜸을 삼는다’고 하였다.
아마 연수 선사가 활동했던 10세기 중국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를 서로 차별된 가르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 간의 공통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사조가 보다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이를 삼교합일(三敎合一)의 관점이라고 부르는데, 연수 선사 이후로 중국 불교계에는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유·불·도를 하나의 지평에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리고 그 관점의 밑바탕에는 모든 종교·철학의 사유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자각이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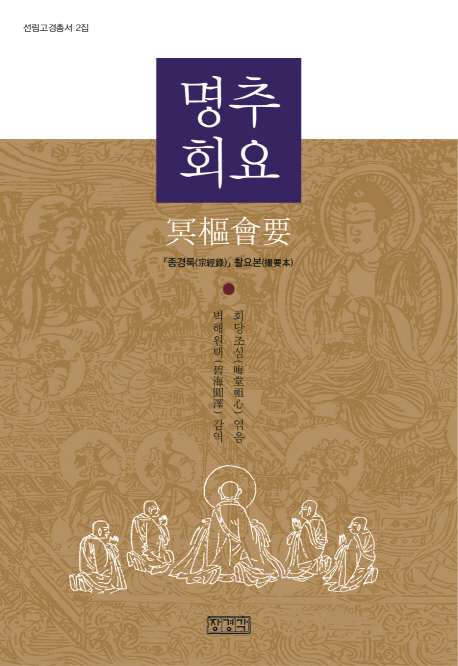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가야산에 흐르는 봄빛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지난 2월 16일 백련암에서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동참 속에 갑진년 정초 아비라기도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저마다 간절한 서원 속에 한 해를 밝힐 공덕을 쌓아 …
원택스님 /
-

기도는 단지 참선을 잘하기 위한 방편인가?
참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선이란 수행법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행법 중에 “오직 참선만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요, 나머지 다른 수행법들은 참선을 잘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
일행스님 /
-

얼굴 좀 펴게나 올빼미여, 이건 봄비가 아닌가
여행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이 잔잔한 기쁨이 물결칩니다. 숙소는 64층인데, 내려다보는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이 정도 높이면 대체로 솔개의 눈으로 …
서종택 /
-

말법시대 참회법과 석경장엄
『미륵대성불경』에서 말하길, 미래세에 이르러 수행자가 미륵에게 귀의하고자 한다면 먼저 과거칠불에게 예배하고 공양하여 과거업장이 소멸되고 수계를 받아야 한다. 신라시대부터 일반 대중은 연등회와 팔관회…
고혜련 /
-

봄나물 예찬
바야흐로 들나물의 계절이 도래하였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아주 작은 주말농장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24절기에 늘 진심입니다. 『고경』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하곤 했지만 절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박성희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